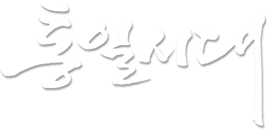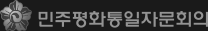북한은 통신혁명 중이라고 할 만큼 휴대전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손전화기’로 불리는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7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나다의 인터넷 소셜미디어 관리 기업인 ‘훗스위트’와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마케팅업체 ‘위아소셜’은 2017년 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77만34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 6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 기관과 장사꾼들은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보급 대수는 더 늘어난다.
이제 평양에서는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통보문)를 보내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북한 TV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휴대전화는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자본가와 장마당 상인들의 필수품이 됐다. 특히 상인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방 각지의 가격을 파악하고 물건을 사고판다. 전화기에는 카메라 기능도 있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 기능까지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촬영과 음악 듣기, 동영상 기능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의미다.
중국에서 메모리 카드나 휴대용저장장치(USB), SD카드(Secure Digital Card,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은 플래시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 등을 저장해 들여와 복사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보 확산의 큰 역할을 하는 수단이 바로 휴대전화이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 음성통화와 메시지 전송 외에도 사진과 동영상, 다매체(멀티미디어) 전송이 가능하지만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 주민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접속 등을 위한 와이파이는 안 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머무르는 평양의 관광호텔, 관공서에서는 와이파이가 가능하다.
북한 사회 발전 척도로 받아들여져
북한 주민들이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관 책임자의 수표(사인)는 물론 담당 보안원 수표까지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동통신등록신청서’는 기관 책임자와 담당 보안원의 승인도장 외에 신청자 이름, 성별, 난 날(태어난 날), 직장 직위, 기업소명, 기업소 전화번호, 공민증(주민등록증) 번호, 집 전화번호, 집 주소 등도 기재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를 신청해서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주민들은 거간꾼(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데, 이 경우 하루 이틀이면 가능하다.
2015년 기준으로 이동통신기구 판매소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오라스콤에서 제작한 아르베기스, 티삽)는 중국 돈 1700위안(한국 돈 약 28만 원), 북한이 자체 생산했다고 선전하는 ‘아리랑 타치폰(스마트폰)’은 2800위안(한국 돈 약 47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통신요금은 1분기 즉, 석 달마다 북한 돈 3000원을 내면 월 200분 통화를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도 20개가량 보낼 수 있다. 북한 노동자 공식 월급이 300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격이 싸지 않다. 게다가 추가 통화를 하려면 별도로 돈을 내고 통화카드를 사야 한다.
주민들은 개통 후 무료로 제공되는 200분을 아껴 사용한다. 200분을 다 사용한 주민들은 중국 돈 100~200위안 정도 하는 유심(USIM)카드를 구매해 다시 사용한다. 유심카드를 분실할 경우 공민증을 가지고 판매소에 가면 유심카드 등록을 다시 할 수 있다. 무료 통화량을 다 쓰면 추가로 돈을 내고 충전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충전카드 비용이 휴대전화 한 대를 더 구입해 쓰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불법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휴대전화를 추가로 구입한다.
평양의 손전화 번호는 ‘1912’로 시작된다. 이는 김일성 주석의 출생연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대전화 기종은 ‘아리랑’과 ‘평양 타치’이다. 생활이 조금 괜찮은 보안원과 당 간부, 장사꾼들은 새로 나온 아리랑 타치폰을 쓰고 있다. 작은(덮개가 없는) 폰과 접이식(폴더) 폰에 이어 타치폰까지 등장하자 주민들은 북한도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2008년 말부터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다. 이집트 ‘오라스콤’사의 투자를 받고 합영회사 형식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해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 들어 북한의 휴대전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0년부터 휴대전화 보급이 활성화됐으며, 2011년에는 지방까지 대중화됐다. 그리고 2013년에 자체적으로 손전화기를 생산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8월 아리랑 손전화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산 휴대전화은 중국에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을 출
임 을 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