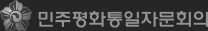대만 총통 선거 이후 양안관계와 동북아 정세
정체성 강화하는 대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통일 지혜
 <사진> 탈(脫)중국을 꿈꾸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자. 그의 ‘대만몽(臺灣夢)’은 동북아에 어떤 파장을 만들 것인가.
<사진> 탈(脫)중국을 꿈꾸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자. 그의 ‘대만몽(臺灣夢)’은 동북아에 어떤 파장을 만들 것인가.
과도하게 엮인 양안 경제관계가 오히려 대만을 독립으로 몰아넣었다. 대만이 ‘친미 · 우일 · 남진(親美·友日·南進)’ 정책을 추진할수록 동북아의 파고는 높아가는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16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民進黨)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당선되었다. 차이잉원이 당선된 첫째 이유로는 국민당 마잉주 정권 8년(2008~2015)간의 경제정책 실패를 꼽을 수 있다. 둘째는 대만에서 ‘대만인’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걸그룹의 대만 출신 가수 쯔위가 한 방송에서 대만기(旗)를 흔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선거 직전에 이슈가 된 사건이 반중 성향의 민진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셋째, 차이잉원이 많은 대만인들이 ‘독립’이나 ‘통일’보다는 양안(兩岸)관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에 착안해 선거기간 내내 중국과의 대립보다 평화와 안정 및 투명한 양안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지지층을 확대한 것이 꼽힌다.
 <사진> 우연찮게 대만의 민진당 압승에 기여한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
<사진> 우연찮게 대만의 민진당 압승에 기여한 걸그룹 ‘트와이스’의 쯔위.
이번 대만 총통 선거에서 핵심 쟁점은 중국에 대한 대만 경제의 과도한 의존과 그에 따른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이었으니 마잉주 정권이 견지해온 중국과의 협력 기조는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안관계의 ‘현상 유지’를 강조함으로써 대만의 민주주의와 정체성은 견지한 상태에서 양안관계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 등을 중시할 것이다.
대외관계에서도 친중 노선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및 동남아,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잉원은 선거기간 동안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의사를 표명했다. 차이잉원 정권이 미국과 관계 강화를 시도하면 향후 미 · 중관계에서 대만 문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동북아 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기초로 중국과 대만을 상대했지만 대만 문제를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다. 반면 중국은 무기 판매를 포함한 미국의 대만 관계 강화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남북관계도 ‘윈윈 구조’ 만들어야
차이잉원 정권은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일본은 중국과의 역내 경쟁관계 때문인지 친중 성향의 국민당보다는 중국과 일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민진당을 선호한다. 차이잉원 당선 직후 일본 외무상은 축하 인사와 함께 대만과 일본은 가치관을 공유한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대만의 TPP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적극 중재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했다.
차이잉원 정권이 미·일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동남아, 인도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친미·우일·남진(親美·友日·南進)’을 추진한다면, 대만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을 낮추고 대만은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과 대만이 지나치게 밀접해지는 것도 반기지 않지만, 대만 문제로 중국과 불필요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 역시 대만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해 미국의 내정 간섭 의도를 축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만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 당국이 미·일과의 협력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중국과 미·일 간 갈등 국면이 출현할 수 있다. 미·중 경쟁관계의 심화는 북핵 문제 및 동북아의 영토 갈등 등을 증폭시켜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만 총통 선거는 중국과 대만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교류협력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분단국의 통일·통합 노력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남북관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성급한 양안 경제 통합 추진으로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와 일자리 감소 등 많은 문제가 촉발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관계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수혜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가 이익을 보는 윈윈(win-win) 구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양안관계는 오랜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은 지속해왔다. 남북한은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는 유지하면서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 병행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만 젊은이들의 중국에 대한 불신과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는 양안 간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현상이 한반도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북한 주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가치’를 발굴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정치학박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임. 저서 <북중 경제협력 심화와 한국의 대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