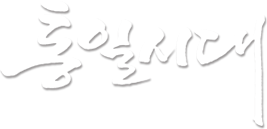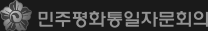평창동계올림픽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모두 막을 내렸다. 오랫동안 올림픽의 꿈을 안고 노력해온 각국 대표선수들의 땀방울은 물론 인종, 국적, 젠더를 뛰어넘어 스포츠로 하나 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큰 감동을 받았다. 게다가 이번 평창올림픽은 전쟁 위기로 치달았던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개막식의 남북 공동 입장이 상징하듯 긴장 속에 대치했던 남북이 하나 됐으며, 미국과 북한의 주요 인사가 속속 평창을 찾으면서 사실상 평화를 위한 외교의 장이 됐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을 둘러싼 국민 인식의 변화 또한 감지되기도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반기면서도 굳이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한 선수들이 공동 입장을 하거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반대 의식이 급속하게 확산된 바 있다. 사실 한반도기는 1991년 첫 남북 단일팀이 출전했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사용된 이후 남북 체육 교류의 상징이면서 통일의 기표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남북 사이의 분단이 더욱 공고화되면서, 상당수의 남한 주민이 더 이상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상상하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하루하루 일상이 더 중요한 이들에게 국가, 분단, 통일은 너무나 먼 이야기다. 그렇기에 남과 북의 영토를 ‘하나’로 그려 넣은 한반도기가 과거처럼 큰 울림을 만들어내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여태껏 우리가 상상해온 통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다. 한반도기에 대한 냉랭한 여론이 가리키듯 분단된 영토의 극복 즉, 분단의 장벽 너머 국토 회복에 머물러 있는 통일 상상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주권, 국민은 지난 분단의 세월을 거치면서 남과 북의 단위로 구분돼 공고화됐다. 분명한 근대국가로 존재하는 북한을 남한이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단순화하는 것 또한 통일을 위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설혹 남과 북의 영토가 하나로 통일된다 하더라도, 주권의 문제 그리고 국민 간의 통합과 화합은 계속 큰 장애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영토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 남북의 ‘사람’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복원하는 것부터 통일을 다시금 상상할 필요가 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확인된 것처럼 결국 남북의 통합과 화해는 사람의 수준에서 시작해야만 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김성경
김성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