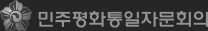북한 제4차 핵실험 도발 배경과 의도
미미한 집권 5년 차 성적표
핵 능력 고도화로 ‘자기 정치’
 <사진>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7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15일 수소탄 시험 진행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올해 1월 3일엔 최종 명령서에 수표했다”며 함께 게재한 김정은 사진.
<사진>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7일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15일 수소탄 시험 진행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올해 1월 3일엔 최종 명령서에 수표했다”며 함께 게재한 김정은 사진.
한국, 미국, 중국으로부터 외면당해온 김정은은 7차 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절박성에 직면해 있었다. 그런 차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않고 모란봉악단 공연도 문제가 되자 핵실험이라는 전략 카드를 즉흥적으로 꺼내들었다.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다.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당황하고 개탄했다. 닷새 전에 발표한 김정은 신년사의 기만술에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대한 마지막 희망도 버려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절망감 때문일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라 단행되었다. 북한의 병진노선은 마오쩌둥이 주창한 ‘양탄일성(兩彈一星)에 근거한 경제 발전 노선’의 김정은 버전이다. 중국은 1964년 원자탄 실험, 1967년 수소탄 실험, 1970년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해 양탄일성을 달성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의 양탄일성이 있었기에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은 수소탄 시험으로 양탄일성을 갖게 되어 체제 안전이 상당 부분 보장된 셈이다. 북한 언론은 ‘수소탄 시험, 북한식 경제 부흥 본격화 신호탄’, ‘수소탄 시험으로 경제 강국 건설 길 열려’ 등의 제목으로 4차 핵실험의 의미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1960년대의 중국과 2010년대 북한 간의 차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냉전과 핵 경쟁으로 핵 개발에 대한 제재가 느슨했다. 중·소 갈등과 미·중 데탕트로의 반전이 가능했으며, 중국은 대국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에 핵 개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상당하다. 그리고 북한은 소국이다.
 <사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영변의 5MW 원자로 옆의 터빈과 발전기가 있는 건물(2013년 8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그때부터 5MW 원자로를 가동해 삼중수소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영변의 5MW 원자로 옆의 터빈과 발전기가 있는 건물(2013년 8월).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그때부터 5MW 원자로를 가동해 삼중수소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여섯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 했다. 그 결정판이 ‘수소탄 실험’인데, 수소를 이용한 증폭핵분열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상당 수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었고, 소형화에도 진전이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강화하면서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북핵을 올려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북한은 2015년 벽두부터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며 대미 공세를 취하다가, 10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핵실험 이후에도 연일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러나 쿠바와 이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미국은 북한이 선(先)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미 협상이라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전략적 결심과 즉흥적 결심 교차
셋째, 최근 북·중관계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개혁·개방과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서도 그를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시진핑에 대해 불만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는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숨어 있다.
넷째,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밀리면서 불안감과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8·25 합의에 대해 북한은 우리의 원칙적인 대북정책에 굴복했다는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 확대의 보상을 기대했으나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돼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도발이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칙적 대응은 매우 단호하다.
다섯째, 백두혈통 세습이라는 태생적 정당성에 집중했던 김정은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줘야 했다. 그런데 경제적 개선은 미미했다.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핵능력의 고도화뿐이다. 북한은 수소탄 실험을 김정은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당대회를 경제 비전을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2월 15일에 핵실험 명령이 하달되고, 올 1월 6일 핵실험이 단행된 이유를 찾아보자. 북한은 지난해 내내 핵실험 택일에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다 12월 12일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되고 모란봉악단이 베이징에서 철수하자 결단을 내린 것 같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교류 확대로 성의를 보였으나,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류윈산 방북 시 보여준 공연 내용이 베이징에서는 문제가 되자 김정은이 곧바로 핵실험 진행 명령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전략적 결심과 즉흥적 정책 결정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1월 8일 김정은의 생일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서울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상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역임. 현재 민주평통 상임위원, 민화협 정책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