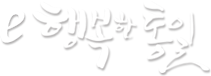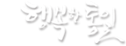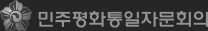인생에는 공짜가 없고, 행복에 이르는 길 역시 밟아 나가야 할 순서가 있다. ‘인내’와 ‘노력’이라는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남한생활에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 온 20대 중반 진선이는 남한에 온 지 딱 열흘 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남한 생활을 온 몸으로 익혔고, 탈북 7년차가 된 지금 대학 졸업반이자 직장 새내기가 되어 화려한 비상을 시작했다. 진선이는 ‘어딜 가든 항상 주변 분들이 저를 좋게 봐 주신다’며 겸손해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미소로 만나는 사람마다 금세 자기편으로 만드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

진선이의 첫 아르바이트 장소는 해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이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남한의 한 일식집에서 외식을 했는데 그때 먹어 본 해산물이 너무 맛있었던 탓에, 식당보조 채용공고가 얼른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주방에서 냉동해산물을 해동해 손질하는 일을 맡았을 때, 처음 보는 생물(?)들이 많아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멍게를 좀 가져오라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미더덕도 그렇고 고니나 해삼도 그렇고요.”
북한에서도 해산물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동태랑 오징어(북한말로 낙지), 임연수는 먹어 봤지만 함경북도 산간지대가 고향인 탓에 다른 건 아예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북한에서 장사를 좀 다녔는데, 청진 기차역에서 마른 낙지를 팔기에 두세 번 사먹어 봤어요. 동해에서 잡히는 낙지는 간이 딱 배고 맛있는 데다, 말리면 하얗게 분가루가 나오는데 그게 되게 달달해요. 동태는 소금에 절인 게 장마당에 나오지만, 명절 때나 사 먹는 게 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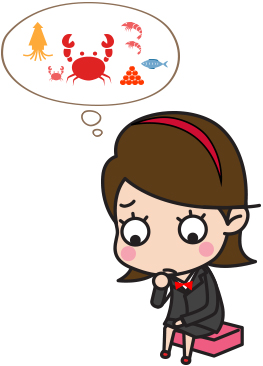 한편, 해물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얼려서 오는데 가끔 ‘생물’로 배달되기도 했다. 진선이는 어느 날 살아있는 게가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열어보고 ‘기절할 뻔 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한편, 해물탕에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얼려서 오는데 가끔 ‘생물’로 배달되기도 했다. 진선이는 어느 날 살아있는 게가 담긴 스티로폼 박스를 열어보고 ‘기절할 뻔 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사장님이 게를 싱크대에 쏟아놓으라고 해서 확 부었는데 뭐가 휙 떨어져서 옆으로 막 걸어가더라고요? 놀라서 이게 뭐냐고, 게가 왜 옆으로 가냐고 물었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막 웃으시면서 ‘진선아 이제부터 내가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퇴근 무렵 진선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찐 게를 맛볼 수 있었다. 게를 찌면 등껍질이 회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게살이 예술적으로 맛있고 게 껍질에 밥을 비벼먹으니, 뭐 이런 천국이 다 있나 하고 생각했다”며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기억만 있었을까. 힘든 일은 없었냐고 물었더니 욕도 부지기수로 먹긴 했단다. 미더덕이나 새우, 해삼 등을 깔끔하게 손질하지 않아 손님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오기도 했고 설거지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야단을 맞기도 했다.
“처음에는 서러웠죠. 알바할 때 욕먹고 저녁에 집에 오면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공원 같은 데 앉아서 씩씩거리곤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욕먹은 거니깐, 다신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니까 네~라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남한 사회를 차츰 익혀가던 중 진선이는 ‘소오름’ 돋는 일을 겪었단다.
“원수를 지면 언젠가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런 게 있나 봐요. 북한에 있을 때 엄청 싸웠던 친구 해미를 남한에서 딱 만난거예요.”
여학생이 싸워봐야 얼마나 심했겠나 싶었는데 ‘머리카락 쥐어뜯기는 기본에, 얼굴에 상처를 낼 정도로 치고 박고 싸웠던 사이’란다. 여기 말로 ‘일진’ 북한 말로 ‘패거리’라고 불리는 그룹의 양쪽 ‘짱’이었던 셈이다.
“윗동네 아랫동네라는 게 있는데, 저를 포함한 윗동네 애들은 (1998년 무렵, 자전거가 있는 집과 없는 집으로 주로 구분 되던) 잘사는 집 아이들이었고, 학교에서 소년단 위원장이나 사로총 부위원장 같은 걸 맡고 있었어요. 소년 휘장이나 넥타이 같은 걸 안 차고 오는 학생들을 되돌려보내고, 바지 칼날이 안 세워져 있거나 주름치마가 단정하지 않으면 벌점을 줬죠. 그땐 기세가 등등해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한에 혼자 와서 아랫동네 해미의 전화를 받으니까 진짜 섬뜩했죠.”
 해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떡장사를 하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진선이는 남한에서 해미와 처음 만났을 때 북한에서의 일로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다지만 그건 기우였을 뿐, 이젠 ‘결혼 소식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친한 사이가 됐단다. 해미는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치른 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진선이는 해미에게 살짝 질투가 났단다. 처음 재회한 날 ‘완전히 딴 애가 된 것 같았다’던 해미.
해미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떡장사를 하다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진선이는 남한에서 해미와 처음 만났을 때 북한에서의 일로 ‘해코지’를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다지만 그건 기우였을 뿐, 이젠 ‘결혼 소식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친한 사이가 됐단다. 해미는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치른 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진선이는 해미에게 살짝 질투가 났단다. 처음 재회한 날 ‘완전히 딴 애가 된 것 같았다’던 해미.
“북한에선 진짜 찌질 했거든요. 북한말로 머저리 같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너무 이뻐진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온지 얼마 안 돼 되게 촌스러웠거든요. 게다가 대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똥그래져서 다시 물었죠, 정말이냐고. 세상에, 저보다 공부도 못했던 애가 대학을 다닌다고 하니까 아, 저도 대학을 가야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했지, 공부도 내가 더 잘했는데 난 왜 안 돼? 라는 생각을 했죠.”
<다음 호에는 미용실에 취직한 진선이의 초고속 승진기와 대학 입학 이야기가 게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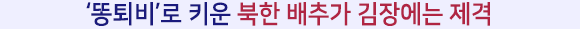
찜통 같았던 한반도에 어느새 추위가 내려앉았다. 11월 초, 이맘때 북한 들녘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10월 당창건기념일이 지나면 ‘강내(옥수수)’를 베어내고 과일도 이미 떨어져 늦사과 늦배마저도 구경할 수 없는 이맘때, 서민들의 양식이 되어주는 건 김장 무와 배추다. 남한은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김장을 하지만 이보다 추운 북한(함경북도)은 대개 10월 말이면 김장이 끝난단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와서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인데, 그나마 김치는 좀 북한 음식 맛에 가깝다고 했다.
“내(가) 식당 다 돌아보면 김치는 대부분 북한 김치하고 비슷해요. 여기에는 김치에다 비린내 나는 걸 많이 넣는데, 북한에서는 싸구재라는 작은 새우를 대부분 넣지요. 배추도 북한 것이 더 맛있어요.”
 한 탈북민 아주머니는 이렇게 남과 북의 배추 맛이 다른 건 북한이 인분, 즉 ‘똥퇴비’를 쓰기 때문이란다. 비료 대신 똥퇴비를 양분으로 크기 때문에 ‘남한 것은 슴슴한 반면, 북한 것은 조그맣고 수확이 좋지 않아도 엄청 달큰하다’고 말한다. 평소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과 밭, 산, 바다에서 나는 북한 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작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북한 것의 향이 강하고 맛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같은 동해산 생선도 ‘북한 바닷고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적게는 20년, 많게는 50여 년을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입맛 자체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음식에 대한 기억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정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고향의 음식뿐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 친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질 듯 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한 탈북민 아주머니는 이렇게 남과 북의 배추 맛이 다른 건 북한이 인분, 즉 ‘똥퇴비’를 쓰기 때문이란다. 비료 대신 똥퇴비를 양분으로 크기 때문에 ‘남한 것은 슴슴한 반면, 북한 것은 조그맣고 수확이 좋지 않아도 엄청 달큰하다’고 말한다. 평소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논과 밭, 산, 바다에서 나는 북한 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다. 과일이나 채소의 경우 ‘작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북한 것의 향이 강하고 맛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같은 동해산 생선도 ‘북한 바닷고기가 더 맛있다’고 생각한다. 적게는 20년, 많게는 50여 년을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입맛 자체가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음식에 대한 기억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정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고향의 음식뿐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 친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질 듯 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글. 기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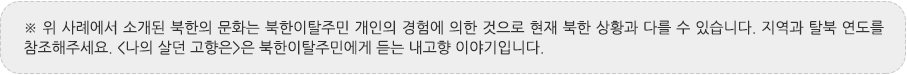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