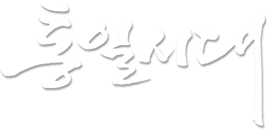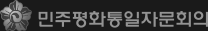최근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과 연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으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 관리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진출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책 수립을 요구하지 않는 등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중국 진출기업뿐 아니라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해온 여행업과 외식업 그리고 문화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접고 철수하기 시작했고, 투자 협력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인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소통의 어려움도 겪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는 사이 중국 기업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국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중국 관광객 급감이 국내 일자리를 약 50만 개 이상 줄이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무엇보다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그대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안보 중심적 접근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맥락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충분한 안보적 고려 없이 제소하거나,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 논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을 벗어나야 하며 중국 철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은 심리적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기로에 선 한중관계에 대한 적절한 처방은 아니다.
이와는 달리 불안정한 한중관계가 우리 안보와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려해 안보와 경제부처 사이의 긴밀한 협의 채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정 부처의 조율되지 않은 정책은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 19차 대회를 통해 시진핑 체제가 강화되는 정치적 함의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 리더십의 의지가 한반도정책에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어렵더라도 연내 한중 정상회담 개최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은 이미 사드 이전부터 경쟁력을 잃고 있었고, 사드 문제의 불확실성이 걷힌다고 해서 기업 경쟁력을 그대로 회복하기도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외교(Sensibility in Diplomacy)가 아니라 침착하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극중(克中)의 방도와 지혜를 찾아나가는 일이다.
 이희옥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