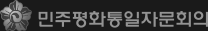“비가 시원하게 내리니까 기분이 좋네요. 하우스 농사라 가뭄에 큰 영향을 받진 않지만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을 키우고 있는 텃밭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으니까요. 농민으로서는 비가 더 많이, 자주 내리길 바랄 따름이죠.”
충북 옥천에서 깻잎 농사를 짓고 있는 탈북민 원정근(60) 씨를 만나기로 한 날, 전국에 비가 내렸다. 긴 가뭄 끝의 단비라 그의 목소리도 밝았다.
원 씨는 2003년 8월 아내와 함께 맨몸으로 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했다. 이듬해에는 두 딸을 데리고 오기 위해 강을 두 번 건넜다.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북에서는 원래 장교였어요. 네 가족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정부 지원이 뚝 끊겼어요. 온 가족이 말 그대로 굶어 죽기 직전이었죠. 탈북밖에 답이 없었어요.”
탈북 직후 중국으로 건너간 원 씨는 2005년 브로커의 도움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한 일은 네 식구를 먹여 살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다. 공부하기를 원했던 두 딸까지 설득해 네 가족이 모두 돈벌이에 나섰다.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던 작은 식품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4대 보험이 됐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주는 취업 장려금도 3년 동안 받을 수 있었죠. 임대아파트가 있던 파주에서 직장이 있던 일산까지 매일 오가야 했는데, 교통비를 아끼려고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서 네 가족이 함께 출퇴근을 했죠.”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인지 통장 잔고는 조금씩 쌓여갔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 조건 탓에 불의의 사고를 면치 못했다.
“미숫가루, 콩가루 등을 만드는 데라 분쇄기가 많았어요. 대부분 노후한 설비들이라 위험요소가 많았는데, 결국 아내가 기계에 손가락을 잘리고 말았죠. 이러다 두 딸까지 죽겠다 싶어 1년 반 만에 그만뒀어요.”
 원정근 씨와 두 딸. 원씨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탈북했다”고 말한다.
원정근 씨와 두 딸. 원씨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탈북했다”고 말한다.
깻잎 농사 3년 만에 땅·집 마련
이후 골프연습장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원 씨는 2011년 뜻밖의 기회를 만났다. 남북하나재단이 마련한 영농 정착 프로그램에 수강생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귀농을 꿈꿔왔던 원 씨는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본격적인 귀농 준비를 시작했다.
“교육이 끝나자마자 강원도 홍천부터 전라도 해남까지 전국 각지를 답사했어요. 어떤 농사를 지을지도 고민하고요. 근데 꿀(양봉)도 사과도 다 한 철만 나잖습니까? 기왕이면 사시사철 나는 작물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힘은 들지만 깻잎을 선택했고, 깻잎 주산지인 충북 옥천에 정착하게 됐어요.”
5, 6년간 모은 돈으로 땅을 임대하고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었다. 첫 달은 남의 집에서 무보수 노동을 하는 대가로 일을 배웠다.
“씨는 어디서 사오는지, 퇴비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 달 동안 무보수로 배우고 둘째 달부터 농사를 시작했는데, 적어도 2개월은 지나야 (깻잎이 자라고 시장에 팔아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처음 3개월은 돈만 까먹었으니 굶어 죽는 줄 알았죠.”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덕분일까. 남들보다 배로 일하고 곱절로 노력한 원 씨네는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고수익을 내는 깻잎 농가로 자리 잡았다. 농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인 2014년에는 땅도 사고 집도 지어 올렸다.
“도시에서는 회사에 다니면 정해진 시간만큼 일하고 정해진 돈을 받잖아요. 농사는 안 그래요. 어떤 때는 1만 원만 벌고 어떤 때는 10만 원을 벌죠. 일도 새벽에 시작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내 일이라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아깝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의 대가가 따라오기도 하고요.”
현재 그는 200평 규모의 땅에 깻잎 농사를 짓고 있다. 그날 딴 깻잎은 작목반을 통해 경매에 부치고, 판매 수익금은 이튿날 통장으로 이체받는다. 큰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일한 만큼 번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은 원 씨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이다.
“네 식구가 빈주먹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다던 두 딸을 뒷바라지할 여력이 없었어요. 다음 세대에는 공부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자, 하지만 우리 네 가족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죠.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온 가족이 똘똘 뭉쳐 버텼어요.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내 땅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어요. 이곳에서 늙을 때까지 일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원 씨는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 외에 더 바랄 게 없다. 그가 자신과 같은 탈북 동료, 후배들에게 다음의 말을 전했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은 없어지기 힘들어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텃세가 심합니다. 그걸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해요. 저는 탈북민들에게 ‘남한 사람들을 능가하게끔 열심히 살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들보다 회사 생활 더 잘하고, 그들보다 더 열심히 농사지으면 됩니다. 만나면 인사 잘하고, 경조사도 잘 챙기세요. 그럼 남한 사람들도 자연히 따르게 돼 있어요. 저희 가족도 그랬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