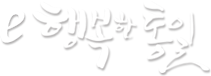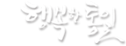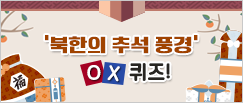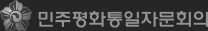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영기 씨(35세, 가명)는 열여섯 살 때부터 가족들의 식량을 구하러 북한 전역을 떠돌다 1990년대 후반 처음 두만강을 건넜다. 이후 북한으로 잡혀 들어간 것만 네 차례, 두 번 다시 북송되지 않겠다며 2001년 말에 어린 동생을 데리고 한국에 왔다. 대학 졸업 후 어렵디어렵다는 취업 문까지 통과해 어엿한 은행원이 된 영기 씨는 이제 한국문화에 거의 적응했지만 가끔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며 2년 전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얼마 전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을 때, 영기 씨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모 도서쇼핑몰에서 책을 주문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심지어는 일주일이 지나도 책이 오지 않는 것이다. 참다 못한 영기 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전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했을 때, 영기 씨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모 도서쇼핑몰에서 책을 주문하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심지어는 일주일이 지나도 책이 오지 않는 것이다. 참다 못한 영기 씨는 쇼핑몰에 전화를 걸었다.
“제가 책을 샀는데 왜 안 오는 겁니까? 일주일이 되도록 아무 연락도 없고요.”
회원 아이디를 묻고 주문 내역을 확인해보던 상담원은 “혹시 이북 사셨어요?”라고 물었다. 이 말에 영기 씨는 깜짝 놀라 하마터먼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단다. 당시 이른바 ‘간첩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그는 ‘탈북민들의 개인정보가 새 나갔나 보다’라는 생각에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손님? 손님은 이북(E-book, 전자책)을 구매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북은 책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용 뷰어(이북을 보는 프로그램)로 보셔야 해요.”
알고 보니 종이 책이 아닌 이북(E-book)을 말한 것이었는데, 영기 씨는 이북(以北), 즉 북한으로 착각한 것이다.
영기 씨는 자신이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북(E-book)에 대해 잘 몰랐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북이 완전히 일반화되지 않은 탓에, 남한 사람들도 다 이북을 알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주자, 영기 씨는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 ‘탈북민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나름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은데도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모른다, 탈북민이어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선입견을 떨칠 수가 없네요.”
단순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남한사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중년의 한 탈북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승·하차 단말기에 가방이나 지갑을 기계에 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봤다. 그래서 아주머니도 슬쩍 가방을 대봤는데 3번 정도 연거푸 반복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 약간 화가 났다고 했다.
“버스카드를 대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말인데도 그걸 모르고, 내가 북한사람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오해는 풀렸다고 했지만, 남북한 주민간 신뢰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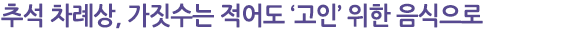
추석 때가 되면 남한에 친인척이 없는 탈북민들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임진각 망배단을 찾아 차례를 지내거나 헌화를 한다. 이산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수십 년간 이곳을 찾는 고령의 실향민들과 함께 먼 북녘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는 것이다. 정림이(가명)와 어머니 역시 명절 무렵이면 북한에 남은 가족 친지들이 더욱 그립다. 하지만 정림이 어머니는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이 그리워도 사진 한 장 갖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누가 사진들을 태워버리라고 하기에 떠날 때 불살라버리고 왔어요. 혹시라도 탈북하다 잡힐까 봐, 나만 죽으면 죽었지 사진이 단서가 돼서 행여 친정 식구들한테 해가 될까 봐 도저히 못 가지고 오겠더라고요.”
방바닥을 닦다가도 식구들만 생각하면 금세 눈물 바람을 한다는 정림이 엄마는, 그리움도 사무치면 병이 된다며, 차라리 사진을 안 갖고 온 게 잘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정림이와 어머니는 추석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위주로 장만해 제사를 올린다. 정림이는 “남한 차례상을 보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차려놓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다 쓰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가진 것이 딱 ‘물 한 사발’밖에 없어도, 망자를 생각하며 제를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며, 자신의 고향 친구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림이와 어머니는 추석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위주로 장만해 제사를 올린다. 정림이는 “남한 차례상을 보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많은 음식을 차려놓는데, 그러면서도 정작 제사 음식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다 쓰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가진 것이 딱 ‘물 한 사발’밖에 없어도, 망자를 생각하며 제를 올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며, 자신의 고향 친구 이야기를 들려준다.
“북한에서는 보리가 익기 전에 식량 떨어지곤 했어요. 식량을 배급할 때 옥수수와 쌀, 콩을 주는데, 그 안에 옥수수대까지 섞어서 주니까 식량이 늘 부족하거든요. 6월 하순에 보리를 수확하고 조금 있으면 감자가 나오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안 죽는다지만, 3월부터 6월까지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그 시기까지 못 기다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정림이 친구 엄마도 결국 굶다가 돌아가셨다. 마을 농장 바로 옆에 친구 엄마의 묘소가 있었는데, 정림이는 몇 년 뒤에 우연히 제사를 올리는 친구 가족을 봤다.
“물을 한 사발 떠놓고 아빠와 친구가 절을 하더니 아빠가 엉엉엉 목 놓아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옥수수죽이라도 올려놓고 싶은데 나도 2~3일을 굶었다고, 그러니까 용서하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굶어죽어도 아들은 꼭 살릴 테니까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으라고 약속하는 걸 봤어요. 본인도 굶었으니까 산소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을 거 아녜요? 그런데 물 한 사발이라도 메고 가는 거죠. 고인을 위해 옥수수죽이라도 올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제사인 거죠. 비록 우리는 남한에 있고 아빠 산소는 북한에 있지만, 차례 음식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엄마와 함께 만들고 있어요.”
<글. 기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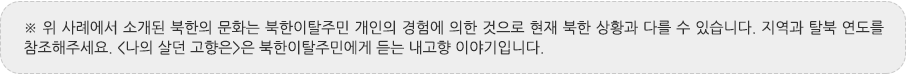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