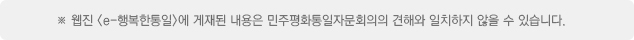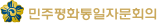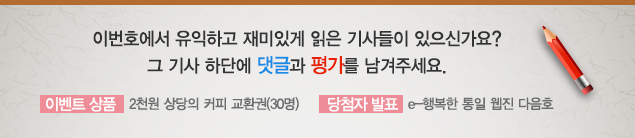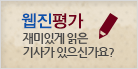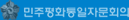고작해야 열 너 댓살이었다. 요즘 같았다면 한창 사춘기로 부모 속 깨나 상하게 했을 나이. 물론 걸음마를 떼기도 전부터 왕도를 배운 터라 생각보다야 초연한 모습이었을 테지만, 자신을 위해 죽어간 귀한 생명들을 뒤로 한 채 ‘칼 같이 얽히고설킨’ 산을 넘고, 고개를 지나 유배지로 향하는 그 마음이야 오죽했을까. 분하고, 두렵고, 서글펐으리라.

화려했던 조선왕조 역사 상 가장 비운 했던 왕을 꼽자면 단연 단종일 것이다. 열두 살에 왕위에 올라 숙부였던 수양대군(훗날 세조)에 의해 고작 열일곱 살에 눈을 감기까지 참 기구한 인생을 살다 간 이 어린 왕의 한이 구구절절 남아 있는 곳이 이곳 영월이다. 때문에, 영월 곳곳을 거닐다 보면 어렵지 않게 단종의 애사와 마주할 수 있다.
그중 장릉은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옮겨 모셨다는 충신 엄홍도와 단종의 혼이 모셔져 있는 곳.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덕분인지 찾는 이가 적지 않은 영월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왕릉 대부분이 서울 또는 경기 지역 평지에 군(群)을 이뤄 조성된 것에 비해, 단종의 묘는 언덕 위 홀로 자리하고 있다. 무신상이나 석호 등 조선왕릉 고유의 화려한 조형물은 없지만, 대신 울창한 소나무가 봉분 주변을 감싼 채 허리를 숙이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무엇보다 사철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 송림에 터를 잡은 산새와 오고가는 관광객들의 발길 덕에 홀로 있지만, 그나마 덜 외롭겠다 싶어 마음이 놓인다.

 단종의 흔적을 보기위해 영월을 찾았다면 장릉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한 곳 있다. 청령포가 그곳이다. 후에 홍수로 인해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유배생활을 했다는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 육육봉이라는 험준한 암벽이 버티고 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육지이되, 섬인 곳이다. 지금도 선착장에서 수시로 운행되는 작은 배에 올라 바닥이 보일만큼 맑은 강물을 5분 여 정도 헤치며 나아가야 닿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자갈로 이루어진 강변에 내려 조금 걸어 오르면 가장 먼저 제법 속 깊은 송림이 맞이해준다.
단종의 흔적을 보기위해 영월을 찾았다면 장릉 외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곳이 또 한 곳 있다. 청령포가 그곳이다. 후에 홍수로 인해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유배생활을 했다는 청령포는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으로 육육봉이라는 험준한 암벽이 버티고 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육지이되, 섬인 곳이다. 지금도 선착장에서 수시로 운행되는 작은 배에 올라 바닥이 보일만큼 맑은 강물을 5분 여 정도 헤치며 나아가야 닿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자갈로 이루어진 강변에 내려 조금 걸어 오르면 가장 먼저 제법 속 깊은 송림이 맞이해준다.
지금으로 보자면 유배지라기보다 휴양림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정돈된 모습이지만, 어린나이에 궁에서 쫓겨나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단종이 보기엔 감옥 그 자체였을 것이다. 청령포 내에는 당시 단종이 기거했던 단종어소를 비롯해 한양에 두고 온 왕비를 그리워하며 돌을 쌓았다는 망향탑이 있다. 또 송림 안쪽으로 단종의 유배 당시의 모습을 보고,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이라 불리는 600년 수령의 훤칠한 소나무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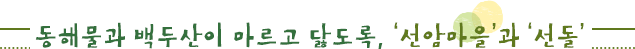
유배지조차 휴양지로 보일 만큼 천혜의 자연경관을 뽐내는 영월 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늘 자신도 모르게 동행하게 되는 일행이 생긴다. 동강과 서강이다. 동강은 정선과 평창 일대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선읍내를 지나 영월 일대에 이르러 동남천 물줄기와 합쳐진 강물을 뜻하며, 서강은 말 그대로 서쪽의 강이란 뜻으로 본래 하천명은 평창강이다.

이 서강이 청령포를 휘감기 전에 지나는 곳이 선암마을인데, 흔히 한반도지형으로 알려진 곳이다. 바다 대신 강물이 감싼 것을 제외하고는 삐져나온 꼬리까지 영락없이 한반도 지형을 닮아 있는 곳으로 전망대 부근에 오르면 만발한 무궁화 꽃밭과 어우러진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불어오는 강바람을 맞으며 선암마을의 전경을 보고 있자면, 자신도 모르사이 애국가 한 소절을 흥얼거리게 될지도 모른다.
서강이 완성한 그림 같은 풍광에는 선돌 역시 빠질 수 없다. 선암마을의 전망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선돌은 서강의 푸른 물과 층암절벽이 어우러져 한 편의 한국화를 보는 기분을 준다하여 ‘신선암’이라고도 불린다. 각종 예능과 영화로 소개되어 익히 알고 있다하여도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은 감동적이다. 칼로 쪼개낸 듯 보이는 입석과 입석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강물, 기암과 절벽이 어우러져 머무는 내내 보는 눈과 가슴 모두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든다.

 옛날만 해도 험준한 산과 고개가 많아 찾는 길손이 적었던 지역이지만, 요즘은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한곳이 됐다. 그렇다보니 어딜 가나 적지 않은 인파와 마주하게 되는데, 조금 한적하게 영월의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조선시대 지어졌다는 금강정을 추천한다. 서강과 달리 유속이 빠른 동강을 앞에 둔 정자 주변으로는 단종과 관련한 유적지가 위치해 있으며, 정자의 현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옛날만 해도 험준한 산과 고개가 많아 찾는 길손이 적었던 지역이지만, 요즘은 손꼽히는 관광지 중 한곳이 됐다. 그렇다보니 어딜 가나 적지 않은 인파와 마주하게 되는데, 조금 한적하게 영월의 자연을 만끽하고 싶다면 조선시대 지어졌다는 금강정을 추천한다. 서강과 달리 유속이 빠른 동강을 앞에 둔 정자 주변으로는 단종과 관련한 유적지가 위치해 있으며, 정자의 현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필이다.
또한 이 금강정에서 지척으로는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충혼탑도 위치해 있으니 가능한 발길을 옮겨 묵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단명한 어린 임금의 목숨만큼이나 피 흘리며 이 땅을 지켜낸 내 형제들의 목숨 역시 귀했었음을 기억하자.


유난히 더웠던 한 낮의 햇살을 피해 나무 그늘로만 발길을 재촉했다면 낮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찾아와주는 밤의 존재가 새삼 반갑기만 하다. 영월의 밤은 짙어진 어둠 사이로 하나둘 등불을 밝히는 작은 빛들이 반짝일 때 시작된다. 청명한 공기 덕에 유난히 별자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강원도. 그 안에서도 영월의 밤은 더욱 특별하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천문대가 있기 때문이다.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이름을 지닌 천문대에 오르면, 문득 학창 시절에 읽었던 알폰소 도데의 ‘별’이라던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 등이 차례대로 떠오른다. 그리고 마침내 ‘청춘’이란 단어와 마주하게 된다. 첫사랑에 설레고, 밤 잠 이루지 못하며 별 하나에도 이름을 붙여 불렀던 그 시절. 사실 지났다고 생각했던 청춘이 생각보다 더 가깝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을 하며 울고, 웃고, 감탄하고 기뻐했다면, 그래서 충분히 즐겁다 생각했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심장은 덜 딱딱해진 것이라 위안한다. 그래서 이 밤 ‘별을 다 세지 못한’ 우리 모두는 아직 청춘 일지도 모른다.


 찰옥수수와 감자떡, 송어회, 곤드레밥, 메밀전병 … 영월하면 떠오르는 먹거리를 손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뜨거운 한 낮의 열기와 신경전을 벌였다면, 진한 콩국물이 고소한 콩국수나 쫄깃한 면발이 착착 감기는 물냉면도 좋은 선택. 물론 강원도를 대표하는 간식거리를 먹을 여지는 따로 남겨두는 게 현명하다.
찰옥수수와 감자떡, 송어회, 곤드레밥, 메밀전병 … 영월하면 떠오르는 먹거리를 손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뜨거운 한 낮의 열기와 신경전을 벌였다면, 진한 콩국물이 고소한 콩국수나 쫄깃한 면발이 착착 감기는 물냉면도 좋은 선택. 물론 강원도를 대표하는 간식거리를 먹을 여지는 따로 남겨두는 게 현명하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