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통일 | 여행이 문화를 만나다
초여름, 대나무 숲에 서면 익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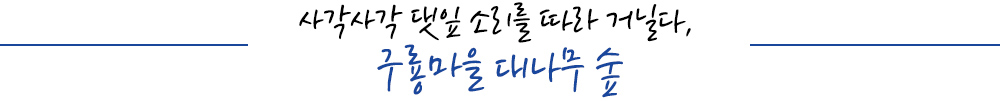
 ▲ 구룡마을 대나무 숲
▲ 구룡마을 대나무 숲
마을 전체를 안고 돌 만큼 넓게 퍼져 있는 대나무 숲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예전 죽공예품을 생업으로 삼았던 시절, 생계를 위해 조성한 대나무 숲은 스스로 품을 넓혀 울창해졌다. 무더운 날이었지만 대숲에 들어서니 온통 서늘한 그늘이고 바람이 댓잎을 스치는 소리가 시원하다. 대나무 낙엽이 켜켜이 쌓여 이불 위를 걷는 것처럼 푹신푹신하다. 그러고 보면 대나무가 몇 백 년 동안 쌓아놓은 역사를 걷고 있는 셈이다.
 ▲ 막 땅속을 뚫고 나온 죽순
혼자 걸어도 같이 걷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걷고 싶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해온 기분이 든다. 채도가 다른 초록으로 가득 찬 비밀의 숲은 천 년 동안 이어온 익산의 역사를 품은 듯하다. 사철 푸르고 부러지나 휘지 않아 옛 선비들이 곁에 두고 마음을 다잡았다는 대나무는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청신해진다. 그 고즈넉함과 고요함은 빠르게 생각하는 청년의 젊음보다는 점차 지혜로워지는 중년의 아름다움 같이 풍부하고 깊어지는 맛이 있다.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데, 그 속도라면 발치의 한 뼘도 안 되는 죽순도 금세 내 키를 넘어 자라겠구나 싶어서 더 유심히 바라본다. 죽순들이 조그맣게 모습을 드러낸 옆,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다. 그렇게 그대도 나도 참 멀리부터 오래 걸어왔구나, 그렇게 스스로 평안했던 시간이었다.
▲ 막 땅속을 뚫고 나온 죽순
혼자 걸어도 같이 걷는 기분이 들고,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걷고 싶다. 이 길을 걷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해온 기분이 든다. 채도가 다른 초록으로 가득 찬 비밀의 숲은 천 년 동안 이어온 익산의 역사를 품은 듯하다. 사철 푸르고 부러지나 휘지 않아 옛 선비들이 곁에 두고 마음을 다잡았다는 대나무는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청신해진다. 그 고즈넉함과 고요함은 빠르게 생각하는 청년의 젊음보다는 점차 지혜로워지는 중년의 아름다움 같이 풍부하고 깊어지는 맛이 있다. 대나무가 자라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성장이 눈에 보일 정도라는데, 그 속도라면 발치의 한 뼘도 안 되는 죽순도 금세 내 키를 넘어 자라겠구나 싶어서 더 유심히 바라본다. 죽순들이 조그맣게 모습을 드러낸 옆,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아 쉬었다. 그렇게 그대도 나도 참 멀리부터 오래 걸어왔구나, 그렇게 스스로 평안했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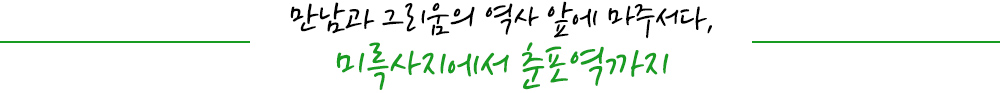
익산은 유서가 깊은 곳이다. 옛 백제의 도읍으로 서동과 선화공주의 전설이 깃든 상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잔디밭과 주춧돌만 남은 빈 터의 공허에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묻는다면, ‘이곳은 어떠한 만남이든 화해든 사랑이든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대답을 하리라.
옛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빌어주었던, 동탑은 사라지고 서탑은 무너져 절반만 남았었다. 그 자리에 다시 천 년 쯤 지나 사람들이 다시 두 개의 탑을 세우고 있다. 머지않아 두 탑은 다시 마주보게 될 것이고, 천 년 쯤 더 지나면 또 다른 전설을 품게 될지도 모른다. 미륵사지에서 전주 방향인 남쪽으로 30여 분쯤 내려오면 춘포역이 있다. 수많은 사연을 품고 그림처럼 오똑하게 서 있는 춘포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으로, 일제 강점기 드넓은 들에서 생산된 곡물을 수탈하기 위해 1914년 일제가 건설한 전라선의 한 역이었다. 철도가 폐선되면서 춘포역은 2011년부터 문을 닫았으나, 2012년부터는 추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역 앞에는 붉은 하트를 소중히 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소년의 조형물이 세워져 있다. 조형물 발아래에는 간절히 소원을 빌면 들어줄 거라는 문구가 조그맣게 적혀 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만남과 이별로 성숙해 나간다. 태어나 만나고 이별하고 또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나가면서 철로가 끝없이 이어지듯 자신의 삶을 이어간다. 그 지점 어딘가에서 마주친 어떤 만남은 멀리서 들려올 것 같은 기차의 경적처럼 반갑고 설렌다. 마중 나가듯 그렇게 계속 걸어간다. 여행은 이어진다.

 ▲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인 춘포역
▲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인 춘포역
 ▲ 춘포역에 설치된 느린우체통
▲ 춘포역에 설치된 느린우체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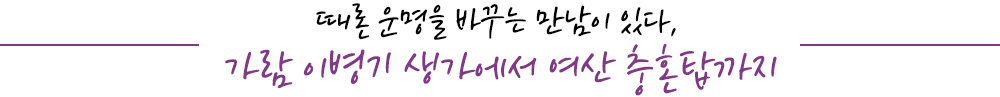
 ▲ 가람 이병기 동상
청년 이병기가 주시경 선생을 만난 건 20세가 되던 1911년, 서울의 조선어강습원에서였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책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강의실에 들어와 열정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던 주시경 선생에 감화되었다. 그때부터 가람은 우리말과 얼을 지키기 위한 길로 뛰어들게 된다. 어쩌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었다. 주시경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람은 국문학 연구를 지속해나간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치렀고,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위원이기도 할 만큼 저명한 국어학자였지만, 대중에게는 시조 시인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잠자코 호올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는 <별>의 구절처럼 홀로 밤하늘과 같은 일제강점기를 지켜온 시대의 거목이었다.
▲ 가람 이병기 동상
청년 이병기가 주시경 선생을 만난 건 20세가 되던 1911년, 서울의 조선어강습원에서였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책 보따리 하나를 옆에 끼고 강의실에 들어와 열정적으로 우리말을 가르치던 주시경 선생에 감화되었다. 그때부터 가람은 우리말과 얼을 지키기 위한 길로 뛰어들게 된다. 어쩌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었다. 주시경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가람은 국문학 연구를 지속해나간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1년간 옥고를 치렀고,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위원이기도 할 만큼 저명한 국어학자였지만, 대중에게는 시조 시인으로 더 알려져 있다. 그는 “잠자코 호올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는 <별>의 구절처럼 홀로 밤하늘과 같은 일제강점기를 지켜온 시대의 거목이었다.
가람이 기거하던 곳은 ‘수우재(守愚齋)’라는 편액이 붙어 있는데, ‘바보처럼 어리석음을 지키는 집’이라는 의미다. 바보가 아닌 보통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 이해관계에 초연한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기와집이 아닌 여러 채의 초가로 이루어진 가람의 생가 역시 그의 담박하고 단단한 성품과 닮지 않았을까 싶다.
자신의 안위보다 조국을 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이어받기라도 한 듯 가람의 생가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여산 공설묘지와 ‘여산 충혼탑’이 있다. 나지막한 산등성이 아래 6.25 전쟁 당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충혼탑이 조성되어 있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비통하고 애달픈 역사가 담겨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곳의 풍경은 그윽하고 평화로웠다. 그것이 지친 여행자의 마음까지 충분히 위로해줄 만큼 따뜻했다.
 ▲ 가람 이병기 생가의 전경
▲ 가람 이병기 생가의 전경
 ▲ 가람이 주로 기거하던 ‘수우재’의 편액
▲ 가람이 주로 기거하던 ‘수우재’의 편액
여행이 시작됐던 구룡마을의 대숲부터 오는 길 내내 익산 어디든 대나무 숲이 있었다. 어쩌면 천 년 전에도 무성했을 대나무 숲처럼, 앞으로의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지 않을까. 또 백년에 한 번 핀다는 대나무 꽃처럼 귀하게 반겨 맞이할 만남을 기다리면서 길도 삶도 이어진다. 오늘도 안녕히, 잘 걸어왔다.
<글: 김혜진 / 사진: 김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