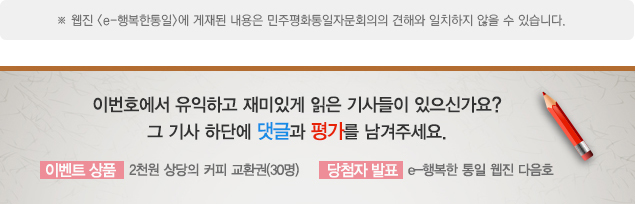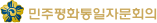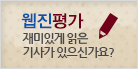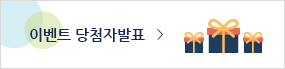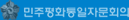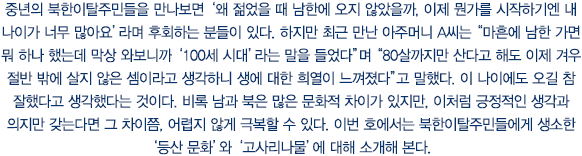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기를 듣기 위해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년의 한 아주머니 A씨와 전화로 약속장소를 막 정하려던 참이었다. ‘어디서 뵐까요?’ 물었더니 대뜸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라고 말한다. ‘조용해서 저는 좋은데, 집에 모르는 사람을 들이면 어머님(A씨)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라고 물었더니 ‘아, 그런가요?’라며 지하철 역 근처 카페로 약속장소를 바군다.
 “평양같은 덴 몰라도 북한의 시골은 다 단층집이거든요. 여기 표현으로 하면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거요. 옆집과 되게 친하고, 오늘 뭐 해먹는지 다 알고, 만나고 싶으면 당연히 나(내) 집이나 너집에서 보는 거지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6년 동안 남의 집이라고는 고향친구네 딱 한 번 가봤어요.”
“평양같은 덴 몰라도 북한의 시골은 다 단층집이거든요. 여기 표현으로 하면 한 지붕 세 가족? 같은 거요. 옆집과 되게 친하고, 오늘 뭐 해먹는지 다 알고, 만나고 싶으면 당연히 나(내) 집이나 너집에서 보는 거지요. 그런데 남한에서는 6년 동안 남의 집이라고는 고향친구네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꼭 친해서가 아니라 ‘보안’을 위해 이웃집을 드나드는 사람도 있단다.
“여기로 말하면 통장쯤 될 것같은데, 통장이 막 때 없이 집을 찾아와요. 괜히 다정한 척 하면서 쓱쓱 살펴보곤 가는 거죠.”
A씨도 당시 남편이 먼저 탈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전화연락이라도 올라치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있다는데.
“감시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담배 한 갑 주면 그날은 본 것도, 들은 것도 다 모른 척 해줘요. 지금 생각하면 담배가 돈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남한에서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는 담배지만 북한에서 거꾸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바꾸기도 한단다.
“국영병원이니까 원장이라고 해봐야 돈도 못 받고 쌀도 못 받잖아요. 직장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이 사람도 오늘 집에 가면 죽을 먹을지, 수돗물을 마셔야 할지, 먹을 게 걱정인거죠. 그래서 아무 것도 안 갖다 주면 요기가 터져도 대충 빨간약이나 발라주면서 가라고 해요. 그런데 ‘고양이 담배’ 한 갑 들고 가서 책상 위에 놔주면 항생제도 놔주고 못 보던 약들도 발라주고 붕대도 감아주고 막 그래요.”

남한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가 등산이다. 특히 진달래 피는 3월은 ‘환상의’ 등산코스가 많다.
“첨엔 되게 신기한 거 있죠. 등산 간다 하기에 참 이상하다, 뭐 하러 그 힘든 산에 가냐고 그랬어요.”
A씨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등산을 가자고 했을 때, 산엔 안 가겠다며 단박에 거절했다.
“거기(북한의) 산은 다 딴딴한 군대머리(민둥산)예요. 다 깎아가서 영농지로 만들었어요. 말로는 산림을 애호하자 하는데, 그 산 바라보느니 옥수수라도 한 포기 더 심어서 내가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을 깎아친 다음, 밭을 뜨지고(갈고) 퇴비를 나르기 위해 산에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산이 집에서 꽤 멀기까지 하다. 세 시간을 걸어갔다가 일하고, 또 다시 세 시간을 걸어서 집에 온다. 그뿐 아니라 마당비 재료인 싸리도 할당량만큼 채취해야 하고, 김일성 생일 무렵에는 진달래도 꺾으러 다녀야 한다. 등산화가 있을 리 만무하다. 고무에 천을 덧대 만든 신발인데 비탈길에서는 자꾸 벗겨지기 일쑤라고.
 남한 직장동료들이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며 계속 권유하자 할 수 없이 등산에 나선 A씨. 그런데 웬걸, 너도나도 알록달록 예쁜 등산복, 등산화 차림에 배낭을 한 짐씩 들고 오는 게 아닌가.
남한 직장동료들이 ‘그냥 몸만 오면 된다’며 계속 권유하자 할 수 없이 등산에 나선 A씨. 그런데 웬걸, 너도나도 알록달록 예쁜 등산복, 등산화 차림에 배낭을 한 짐씩 들고 오는 게 아닌가.
“먹을 걸 요만큼 싸가지고 올라가서 다 펴놓구 먹으면서 놀더라고요. 첨엔 ‘아니,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먹지, 왜 산에까지 와서 먹냐’, 정말 신기하다 했어요. 왜 산엘 올라가냐 했더니 그냥 산꼭대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러 간대요. 보면 어쩌고 안보면 어쩌고, 참 취향 한 번 신기하다 그랬죠.”
A씨는 등산과 함께 봄이 되서 즐거운 건 ‘축제’ 때문이라고도 했다.
“봄 되면 축제를 많이 다녀요. 딸기축제, 대게축제, 꽃축제도 다 가봤는데 좀 비싼 것 같긴 하지만, 저희는 남한에 친척이 없으니까 평소 지방에 갈 기회가 없는데 여행갈 때 일부러 축제장으로 다니면서, 그 지방에 대해서도 알고 축제도 보고 그래요. 축제란 게 참 좋더라고요.”

A씨는 처음 남한에 왔을 때 그동안 잘 먹어보지 못했던 고기, 특히 삼겹살을 주로 먹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건강을 위해 산채비빔밥이나 나물 등 채식을 좋아하게 됐다. 그런데 고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재밌다.
“고사리를 그냥 데쳐 먹으면 너무 쌕쌕(뻣뻣)해서 잘 안 먹어요. 북한에선 먹는 방법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풀어지게 삶아서 육수에 넣고 부드럽게 먹더라고요.”
북한에서 고사리는 ‘수출품’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린다. 시금치나물이 5~10원이라면 고사리는 2천~3천 원정도이기 때문에 산간 고사리농장으로 고사리를 캐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한 번 먹어보긴 했는데 맛도 없는 이게 왜 비싸게 팔리는지 참 이상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 있죠. 싸기도 하고 몸에도 좋다고 하고요.”
“북한에서도 한 번 먹어보긴 했는데 맛도 없는 이게 왜 비싸게 팔리는지 참 이상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 있죠. 싸기도 하고 몸에도 좋다고 하고요.”
A씨는 약령시장 약초들을 봤는데, ‘중국산’이라고 씌여있지만 ‘북한산’일 것 같다고 말한다. 북한에서 삽주,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 같은 것을 개인이 조금씩 따서 말려두면 전부 수출한다며 가져갔다는 것이다. 만약 그 약재들이 북한산이라면 적어도 농약 걱정은 안하고 드셔도 될 것다고 A씨는 말했다.
봄이 되면 북한은 농사준비로 온 나라가 분주해진다. 봄엔 밭갈이 전투, 여름엔 풀베기 전투, 그리고 가을 수확철에도 자주 동원되는데 ‘동원’이라는 개념이 여기와는 다르다고 했다.
 “거기(북한)는 내 노력을 무자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한 대가를 딱딱 주잖아요. 남한에선 직장을 다니면서 단지 나를 위해 돈을 번 것뿐인데, 저보고 열심히 산대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여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거기(북한)는 내 노력을 무자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한 대가를 딱딱 주잖아요. 남한에선 직장을 다니면서 단지 나를 위해 돈을 번 것뿐인데, 저보고 열심히 산대요.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여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A씨는 남편과 가끔 이렇게 이야기한단다. ‘우리 애들은 부모를 너무 잘 만났다’고.
“남북이 분단된 게 우리 탓도 아니고, 부모 세대 잘못만나서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남한으로 왔으니 우리 애들은 이제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애들은 이제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겠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노후를 잘 준비할 거고요.”
<글. 기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