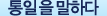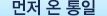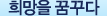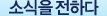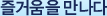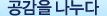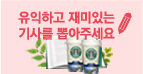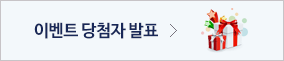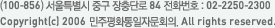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 와 오랫동안 살다가 2년 전 남한에 온 한 북한여성과, 중국에 잠깐 머물다 6년 전 한국으로 온 북한남성이 부부의 연을 맺어 함께 살고 있었다. 각자 북한에 두고 온 자녀가 있어 남 몰래 눈물 흘리면서도, 낯선 사회에 와서 서로를 다독이고 의지하며 열심히 살고 A씨 부부. 같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 떼이기도 한 적이 있다는 오지랖 넓은 남편, ‘친절한’ 남한 남성들 마다하고 성실함 하나에 반해 ‘남편 바라기’를 하는 아내. 이들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하거나 이사를 오면 남한 사람들도 자기 고향의 사투리를 버리고 서울말을 배우려고 하는 것처럼, 아내 B씨도 남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말투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내가 ‘재간이 좋다야’ 했더니 재간이라는 말을 남한에서는 안 쓴다는 거예요. 또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많이 배워야겠다 생각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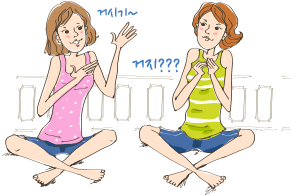 하지만 남편 A씨는 북한말 쓰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남편 A씨는 북한말 쓰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우리가 북한에서 좀 오래 살았나? 누가 나더러 ‘형님 혹시 거제도가 고향 아니에요?’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나는 함북도에서 40년 넘게 산 사람인데, 거제도가 어디요? 경상남도요?’라고 물어봤지.”
A씨는 평소에도 말투 때문에 중국에서 왔는지, 경상도에서 왔는지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한다.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남한 사람들을 자주 봤다고.
하지만 북한말이 남한사람들에게 낯설게 들리는 것처럼, 남한 사투리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는 모양이다. A씨가 재미있어 하는 남한 사투리는 ‘거시기’였다.
“광주에 출장을 갔는데 거시기, 거시기… 모든 말이 거시기라고 하면 다 통하더만. 그 말 하나만 알아도 광주에선 다 통할 것 같아.”
북한에서는 ‘거시기’라는 단어를 안 쓰냐고 물었더니 그런 말은 없다며 처음엔 ‘거지’라는 뜻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
“북한에서는 아니 쓰거든요. 난 할아버지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했지. 하하하.”

남편 A씨의 취미는 TV에서 ‘체육(스포츠)’을 관람하는 것이다.
“남한엔 전기가 24시간 들오니까, 아무 때나 TV를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체육을 좋아하니까, 주로 축구를 많이 보지. 프리미어리그도 보고,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도 다 좋아해서 어쩔 때는 밤(잠)을 자지 않고 출근한 적도 있어.”
아내 B씨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편하게 누워 드라마라도 좀 보고 싶은데, 남편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투덜거렸다. 그렇다면 이런 B씨의 취미는 무엇일까? 바로 쇼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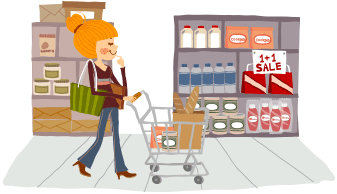 “아프다가도 쇼핑하러 간다고 하면 싹~ 나아요. 마트에 가서 옷도 사고 남새(채소)랑 과일도 사고. 내가 과일을 무척 좋아하거든. 난 중국을 거쳐서 왔지만 북한에서 직행 오는 사람들은 생선이나 과일이 사철 없는 게 없어서 놀랄 거야. 싱싱하고, 눈에 몽땅 풍년이고….”
“아프다가도 쇼핑하러 간다고 하면 싹~ 나아요. 마트에 가서 옷도 사고 남새(채소)랑 과일도 사고. 내가 과일을 무척 좋아하거든. 난 중국을 거쳐서 왔지만 북한에서 직행 오는 사람들은 생선이나 과일이 사철 없는 게 없어서 놀랄 거야. 싱싱하고, 눈에 몽땅 풍년이고….”
“비싸잖아”라며 남편이 끼어들자 아내 B씨는 “비싸긴 비싸지. 하지만 다 사먹을 수는 있잖아” 라고 대꾸했다. 또 “과일도 과일이지만, 남한에 오니까 소 양념불고기가 참 맛있더 라고요. 북한에서 구경할 수도 없거든요” 라고 말하는 B씨. 북한에서 소는 인력을 대신하기 때문에 거의 사람과 같이 취급되고 있고, 소고기는 일종의 약재라고 봐야 된다는 게 남편의 설명이었다.
이렇게 음식과 물건이 풍족하게 넘쳐나는 남한이라지만 조금 못마땅한 것도 있다는 B씨.
“옷가지들을 여기서는 중고함에 싹 버리잖아요. 입을만한 괜찮은 것들 막 나가는 거 보면 어쩔 때는 몇 번 졌다 놨다 졌다 놨다 해요. 어휴, 북한에선 막 따(까)져서 끼매서(꿰매서) 작은 것들은 늘꿔 가지고(늘려서) 입는데, 저런 것들 들고 가서 하나씩 다 노나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A씨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이유가 궁금해졌다. 남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북한 남자들은 여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자들이 굉장히 친절한걸 보고 ‘아, 저런 게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을 보니까 풍습이나 음식도 잘 안 맞고 해서 풍파를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났지. 결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방탕한 생활도 안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보니까 마음 맞춰서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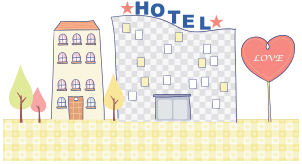 하지만 A씨 부부는 탈북 시기도 다르고, 북한에 있을 때의 신분도 달랐기 때문에 가끔 의견충돌이 있었다. 남편 A씨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탈북 시기도 다르고, 북한에 있을 때의 신분도 달랐기 때문에 가끔 의견충돌이 있었다. 남편 A씨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했다.
“내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남자아를 낳아야 좋다고 했어. 며느리들이 아들을 낳으면 미역국도 끓여주고 돼지발족 (족발)을 사가지고 차려주는데 딸 낳으면 값이 없었어.”
하지만 한 잔 걸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 B씨는 “그런 소리 그만 하고, 오빠는 얼른 나가서 이거(음식물쓰레기봉투)나 버리고 와요”라며 등을 떠밀었다. 그러자 A씨는“북한에서는 남편한테 시키는 일 없었는데…” 투덜대면서도 쓰레기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아내 B씨에게 북한에서도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지 물었더니, 아이의 이름을 넣어 ‘아무개 아빠’라고 부르거나 시누이의 이름을 넣어 ‘아무개 오빠’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그러다 문득, 북한의 연예문화가 궁금해졌다. 둘 다 40대 중반을 넘긴 남녀였기 때문에 그닥 실례가 될 것 같지 않아 대뜸 ‘러브호텔’이란 게 북한에도 있느냐고 물었다. 아내 B씨는 ‘그게 뭐냐?’며 되물었고 남편 A씨는 북한에 여관은 있지만 모텔은 없고 여관에 들어가도 신분증을 다 내야하며, 지방 출장을 갔을 때나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탈북 당시까지만 해도 청진이나 나진 모두 ‘그런 식(러브호텔)’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곳은 없었다고.
“보통은 녀자가 이끄는 개인집을 가지. 예를 들어 김책시 같은 큰 도시에는 돈 있는 남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야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녀자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받은 돈으로 옥수수를 사서 국수하고 바꿔서 온가족이 노나 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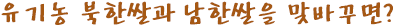
북한에 가족들이 남아 있어서 더욱 그러하겠지만, 통일에 대한 생각만큼은 A씨 부부 모두에게 매우 간절한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 B씨는 남한 사람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것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린 남조선을 절대 남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날 이때껏 살아왔는데, 여기 오니까 다르더라고. 우리는 통일이 돼야 조선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못산다고… 우리의 소원, 그 노래가 우리 진심에 대한 노래란 말이에요.”
 이들 부부는 식량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사람들도 일을 잘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온 가족이 끼니 잇기도 바쁘니까, 옥수수가 푼푼하면(넉넉 하면)…” 이라고 말을 시작하자 A씨가 불쑥 끼어들었다.
이들 부부는 식량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사람들도 일을 잘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B씨가 “온 가족이 끼니 잇기도 바쁘니까, 옥수수가 푼푼하면(넉넉 하면)…” 이라고 말을 시작하자 A씨가 불쑥 끼어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옥수수라고 하면 잘 못 생각 할 수 있어. 북한은 옥수수쌀이 입쌀의 절반 값이지만 여기는 옥수수가 더 비싸.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에 놀란 B씨. ‘여기서 옥수수쌀을 팔지는 않지요?’고 묻기에 ‘가공하지 않은 생 옥수수나 통조림, 혹은 뻥튀기 같은 것을 먹는다’고 대답해주었다.
그때 A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놨다.
“북한에선 대부분 유기농으로 농사를 하니까, 그 유기농 쌀을 남한쌀과 바꾸는 거지요. 예를 들면 2톤짜리 북한유기농 쌀하고 10톤짜리 남한 일반 쌀하고 말이지. 대비가 좀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북한은 다 먹고 살아요.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
A씨는 쌀 뿐만 아니라 북한 사과나 배도 조선 고유의 맛과 향이 나오고, 북한 남새(채소)도 자연의 바람으로 그대로 생산하니까 남한에서도 매우 인기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 기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