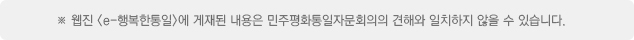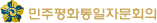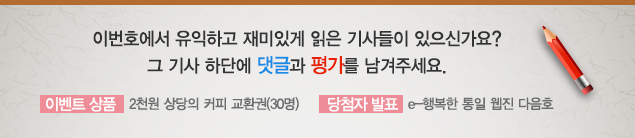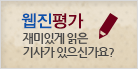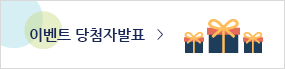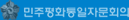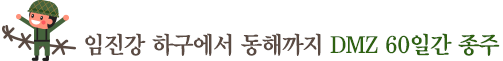
 DMZ 종주를 마친 서재철 전문위원은 요즘 60~70년대 군사시설들이 위치한 DMZ 내 재해위험 조사와 복구복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한반도 기후변화로 폭우가 내리면 토석류가 쓸려 내려와 시설들이 유실될 수 있어서다. 쉽게 말해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일들이 DMZ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DMZ 종주를 마친 서재철 전문위원은 요즘 60~70년대 군사시설들이 위치한 DMZ 내 재해위험 조사와 복구복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다. 한반도 기후변화로 폭우가 내리면 토석류가 쓸려 내려와 시설들이 유실될 수 있어서다. 쉽게 말해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일들이 DMZ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는 흔히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많이 혼동해서 쓰인다.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자면 1953년 ‘한국 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졌고, 이 기준선을 중심으로 양측이 각각 2km씩 물러나면서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이 설정됐는데 그 폭 4km 구간이 비무장지대이다. 반면 민통선은 비무장지대가 형성된 다음 해인 1954년 비무장지대의 경계를 위해 만들어진 구간으로 철책선 남쪽에서 약 5~20km가량에 이르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이북까지 포함시켜 흔히 ‘비무장지대 일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DMZ 남방한계선 안쪽. 그곳에서 서 위원은 100년 전 한반도 자연의 모습, 근대화 이전 농경사회의 우리 모습을 봤다고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판부동 습지. 판부동 습지부터 사미천 비무장지대 안에는 전쟁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집터나 농사를 짓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 논이 다시 습지로 복원되고 있었다.
“일반 논두렁 밭두렁도 농약만 없으면 온갖 작은 생명들의 물 좋은 터전인데, 아예 농사를 짓지 않고 60~70년 넘게 그대로 둔 거잖아요. 그야말로 자연의 지상낙원으로 변모해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농지의 흔적이 이렇게 곳곳에 스며든 채 습지로 형성된 곳이 또 있을까요? 버려진 논두렁마다 작은 생명들이 들끓고 있고, 겨울이면 각종 철새가 몰려듭니다. 텃새와 어류, 양서・파충류와 곤충도 많고요.”
 DMZ를 지키는 군인들은 이곳 습지에서 매일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듯 고라니와 마주한다. 고라니는 만주 일부와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국제적 기준과 가치로 보면 반달가슴곰과 견줄 정도라고. 백암산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사향노루가 병사들의 친구노릇을 하고 있다. 사향노루는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종적을 감춘 동물로 가곡 ‘비목’의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가사에 나오는 ‘궁노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DMZ를 지키는 군인들은 이곳 습지에서 매일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듯 고라니와 마주한다. 고라니는 만주 일부와 한반도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종으로, 국제적 기준과 가치로 보면 반달가슴곰과 견줄 정도라고. 백암산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사향노루가 병사들의 친구노릇을 하고 있다. 사향노루는 1970년대 이후 남한에서 종적을 감춘 동물로 가곡 ‘비목’의 ‘궁노루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가사에 나오는 ‘궁노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서희령에서는 법정보호종인 솔나리의 최대 군락지를 발견했고 북한강 21사단 작전구역에는 한국특산종인 금강초롱이 지천으로 널려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과거 ‘고지전’이라 불리던 치열한 전쟁의 현장. 피의 흔적 역시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서 위원은 “야생화 무더기를 헤치고 땅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뼈나 전투복만 없을 뿐이지 쇠붙이 같은 게 여기저기 널려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비무장지대와 인근 민통선 지역은 멸종 위기 동식물 1급인 두루미 중 800마리가 겨울을 나고 어름치와 묵납자루 등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반달곰과 산양, 수달, 담비, 삵 등 희귀 포유동물들이 살고 있어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의 안정적인 서식지가 돼 주고 있다.
비무장지대와 인근 민통선 지역은 멸종 위기 동식물 1급인 두루미 중 800마리가 겨울을 나고 어름치와 묵납자루 등 어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반달곰과 산양, 수달, 담비, 삵 등 희귀 포유동물들이 살고 있어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의 안정적인 서식지가 돼 주고 있다.
“직접 관찰한 결과 확실히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자연 생태계의 횡축이었어요. 인간의 간섭이 적기 때문이죠. 비무장지대 경계부대에는 ‘동물을 잡거나 해치면 부대에 사고가 난다’는 미신이 있어 야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군인을 만나도 피하지 않고 물끄러미 쳐다보기만 하죠.”

 이처럼 경이로운 자연을 가진 DMZ지만 서 위원은 이곳이 전쟁과 대결의 최일선이었고 아직도 분단의 현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다만 1960년대 후반 무렵, 거의 사흘이 멀다 하고 전쟁 일보직전의 교전이 지속됐던데 반해 현재 DMZ 내 남북한 군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서 위원은 종주하는 동안 각 부대 일반 사병들의 ‘속살’,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쌩얼’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경이로운 자연을 가진 DMZ지만 서 위원은 이곳이 전쟁과 대결의 최일선이었고 아직도 분단의 현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다만 1960년대 후반 무렵, 거의 사흘이 멀다 하고 전쟁 일보직전의 교전이 지속됐던데 반해 현재 DMZ 내 남북한 군인들의 일상은 생각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서 위원은 종주하는 동안 각 부대 일반 사병들의 ‘속살’,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쌩얼’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했다.
“애들 같기도 하고 풋풋하기도 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요즘 군인들은 군대 물품 대신 자기 취향의 속옷이나 화장품을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요. 웬만한 부대의 구내식당마다 밥도 괜찮게 나오던데 밥 먹기 싫다며 컵라면에 밥을 말아 먹는 거 보고 놀랐어요. 물론 생활이 자유로워졌다는 것일 뿐 군 기강 만큼은 확실하지요.”
반면 부대에서 고성능망원경으로 넘겨다본 북한 군인들은 졸거나 밭을 일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북한처럼 10년간 군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군기가 있겠어요. 그냥 생활이죠.”
북한 병사들의 지치고 곤궁한 표정만큼이나 서 위원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북쪽 지역의 헐벗고 황폐한 산이었다. 비무장지대 북방 한계선 이북은 어디나 할 것 없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풀과 흙뿐이었다.
“민둥산이었죠. 충격적이었어요. 산림만 봐도 북한이 어렵다는 게 확연히 느껴져서 더이상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 지역에 산림복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시작됐죠. 임진강의 수해도 산림의 황폐화 때문입니다. 한반도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나서서 산림기술을 지원하고 묘목과 종자를 보내 복구에 나서야 해요.”

현재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은 전 세계 국경 중 가장 삼엄하고 비무장지대 바로 뒤에 배치된 군사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서재철 위원은 DMZ를 종주하면서 이 비극의 공간에 대해 발상을 전환하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세기 인류를 가장 크게 짓눌렀던 게 냉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냉전의 유적이나 유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경쟁력은 차이로부터 오는 법. 실제로 외신 기자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곳 1순위가 DMZ라고.
 “독일은 통일의 기쁨에 젖어 1,400km에 가까운 장벽과 철조망을 다 걷어버렸어요. 3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요. 한반도의 DMZ는 이제 냉전을 상징하는 마지막 공간이 된 겁니다.”
“독일은 통일의 기쁨에 젖어 1,400km에 가까운 장벽과 철조망을 다 걷어버렸어요. 3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지요. 한반도의 DMZ는 이제 냉전을 상징하는 마지막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서재철 전문위원은 DMZ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촌에서 ‘길’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곳은 스페인의 산티아고와 일본의 쿠마노고도(熊野古道) 두 곳인데, DMZ는 비무장지대는 생태계 보고인 동시에 냉전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문화탐방로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했다. 이런 서 위원의 말처럼 분단의 비극과 아픔의 상징이었던 DMZ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아픔의 역사로 머물지 않고 평화의 메시지를 지구촌에 던져줄 수 있는 공간으로 승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글. 기자희 / 사진제공. 서재철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