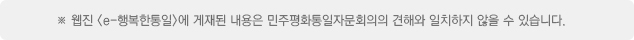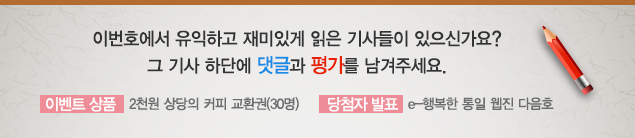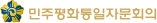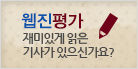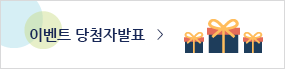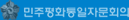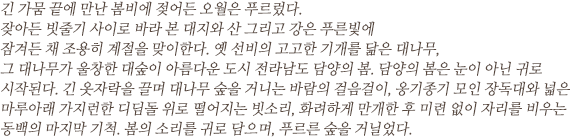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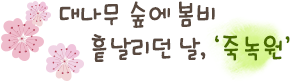
담양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대나무일 것이다. 실제로 담양은 오래 전부터 대나무고을이라 하여, ‘죽향’(竹鄕)으로 불려왔다. 허리를 곧추세운 채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올라간 대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룬 곳. 담양의 죽녹원은 그 이름처럼 18만여㎡에 이르는 대지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보니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쏠쏠한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단연 숲, 그 자체다.

그 특성상 사철 푸르지만, 계절의 온기를 머금은 채 흔들리는 대나무는 유독 싱그럽다. 서로의 살갗을 부비는 대나무 잎의 사그락거림은 도심 속 소음에 지친 귓가를 느긋하게 다독인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차분히 길을 오르다 보면 어느 샌가 보이는 건 오로지 대나무만 가득한 숲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그제야 낯선 듯 낯익은 제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숨을 들이 마시고, 다시 내쉬고. 바람이 지날 때, 가슴 속에 쌓아만 뒀던 탁한 숨을 실려 보낸다. 그리고 새 숨을 가득 품는다.
8개의 테마로 나뉜 그리 길지 않은 산책로를 걸어도 좋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좀 쉬어가고 싶다면 산책로 곳곳에 놓인 나무 정자와 벤치를 이용하거나, 죽녹원 한쪽의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설렁설렁 구경한다. 한옥체험장을 비롯해 담양의 이름 높았던 선비들이 기거했던 처소나 정자를 고스란히 재현한 공간으로 넓은 툇마루에 턱 하니 걸터앉아 간간히 울리는 풍경소리를 감상하기에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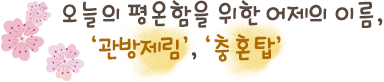
죽녹원 앞쪽으로는 제법 물길이 드센 담양천이 흐르는데, 이 담양천 너머 담양의 오래된 숲길 하나가 더 자리하고 있다. 바로 관방제림이다. 천연기념물 제 366호로도 지정되어 있는 관방제림은 수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방이다. 조선 인조 26년, 사나운 담양천의 물길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고, 그 위에 한 그루, 두 그루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관방제림이 됐다. 느티나무, 팽나무, 벚나무, 은단풍 등 현재는 보호수 177그루가 자생하고 있으며, 긴 세월을 살아 온 만큼 두 팔을 힘껏 뻗어도 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풍채 좋은 고목들이 길손의 머리 위로 긴 그늘을 만들어 준다.

 죽녹원과 인접해 있으며, 관방제림이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관어공원은 담양 시민들의 쉼터이자, 벚꽃이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숨은 명소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충혼탑이다. 한국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눈을 감아야 했던 호국영령들을 봉안하고 추모하기 위한 시설로 담양의 현충시설답게 12개의 대나무모양 기둥이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선을 붙잡는다.
죽녹원과 인접해 있으며, 관방제림이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관어공원은 담양 시민들의 쉼터이자, 벚꽃이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숨은 명소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바로 충혼탑이다. 한국전쟁 당시 조국 수호를 위해 눈을 감아야 했던 호국영령들을 봉안하고 추모하기 위한 시설로 담양의 현충시설답게 12개의 대나무모양 기둥이 연립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선을 붙잡는다.
흔히 담양의 매력을 전통이라고 표현한다. 옛 것을 소중히 지켜왔다는 도시, 그 도심이 한 눈에 들어오는 장소에 위치한 충혼탑. 지금껏 지켜 온 전통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전통 역시,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눈을 감은 아름다운 이들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 했을 일이다.

빗방울이 흩어질 때마다 눈송이처럼 휘날리는 벚꽃을 뒤로 하고 다시 2km 정도 되는 관방제림을 끝까지 걸어, 도로 하나를 건넌다. 다시 또 숲길이다. 길 위에서 만난 새로운 길. 이번에 만난 길의 이름은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낙엽침엽수인 메타세쿼이아가 양쪽으로 늘어선 산책로는 마치 숲속에 들어선 듯 아늑한 기분마저 느끼게 한다. 사시사철 다른 매력을 선보이지만, 이맘때라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햇살을 만끽하길 추천한다.
또 긴 산책로는 연인들이 손만 마주 잡고 걸어도, 영화 속 한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영화와 CF 등이 촬영된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영화 ‘역린’ 속 정조 임금의 서가로 등장했던 존현각 세트장이 바로 이어져 있다. 실제 존현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도가 심했기에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세트를 재현했다고 하니, 한번 쯤 쉬어가도 좋겠다.


작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제법 호쾌해 오후의 노곤했던 정신을 두들겨 깨우기엔 손색이 없다. 기대보다 아담한 공간. 하지만, 머물수록 감탄하게 되는 곳이 바로 소쇄원이다. 조선중기 호남 사림문화를 이끈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별서정원(휴양을 위하여 경치 좋은 터전을 골라 따로 마련한 집)’ 가운데 하나로 ‘한국인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국내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양산보가 속세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하겠다는 뜻으로 조성한 곳으로 크게 내원과 외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흔히 말하는 소쇄원은 내원을 뜻한다. 특히 ‘비갠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방, ‘광풍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원림의 풍취가 압권이다. 광풍각의 넓은 툇마루에 앉아 계절을 품고 떨어지는 계류를 보고 있자면 무릉도원이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조선시대 문인이었던 양산보가 속세의 뜻을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하겠다는 뜻으로 조성한 곳으로 크게 내원과 외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흔히 말하는 소쇄원은 내원을 뜻한다. 특히 ‘비갠 뒤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방, ‘광풍각’에서 바라보는 한국 원림의 풍취가 압권이다. 광풍각의 넓은 툇마루에 앉아 계절을 품고 떨어지는 계류를 보고 있자면 무릉도원이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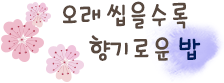
 신선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정경에 취한 사이 슬슬 시장기가 올라온다. 속세에 살아가는 인간인 즉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겠는가. 이왕 담양까지 발걸음을 했으니 대나무 요리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할 것 같아, 대나무 죽통밥 집으로 향해 본다.
신선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정경에 취한 사이 슬슬 시장기가 올라온다. 속세에 살아가는 인간인 즉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겠는가. 이왕 담양까지 발걸음을 했으니 대나무 요리 하나 정도는 먹어줘야 할 것 같아, 대나무 죽통밥 집으로 향해 본다.
쫀득하고 감칠맛 있는 밥 한 수저를 한 입 가득 물자 대나무 향이 솔솔 피어오른다. 오래 씹을수록 은은한 단맛이 오르는 밥 한 술에 지역 명물인 떡갈비 한 점을 올려 먹으면, 비로소 담양 여행이 완성된다. 기회가 된다면 4월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연한 죽순 요리 역시 놓치지 말 것.

담양의 봄은 푸른 숲이다. 푸름을 쫓아 걷다 보니 새로운 푸르름과 마주하게 된다. 영화 속 대사처럼 여행을 시작할 때 사막처럼 황량했던 마음속에도 어느덧 나무숲이 우거지기 시작한다. 그 숲엔 신선한 바람이 불고, 나른한 햇살과 넉넉한 나무 그늘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풍요로운 숲, 그 숲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