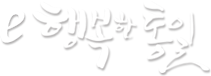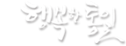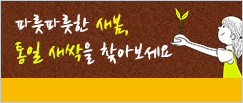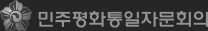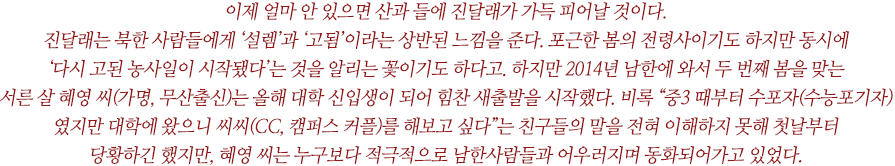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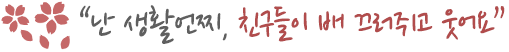
중국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고 ‘직행’으로 남한으로 온 혜영 씨. 북한에서 ‘또로로하게(똑똑하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지만,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낯설어 실수투성이였다는 그녀는 스스로를 ‘생활언찌(매사에 서투르기만 한 사람을 뜻하는 북한말)’라고 불렀다. 생활 속에서 실수를 연발해 친구들이 ‘배 끄러쥐고(배를 쥐고)’ 웃는다는 것.
은행에서 현금인출기를 처음 혼자서 사용해보던 날, 기계음이 시키는 대로 통장을 넣고 인출 금액을 누른 다음 비밀번호까지 다 입력했는데 한참 기다려도 돈이 나오지 않았다.
“북한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이렇고 손 놓고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거 다 협잡(사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혜영 씨는 당장 2층 영업점으로 달려갔고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혜영 씨는 처음에 왜 현금을 찾지 못했을까? 바로 맨 마지막 과정인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가만히 기계를 지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탈북민의 은행 이용기 더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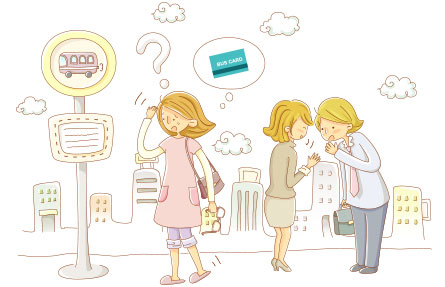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친척집에 가느라 경기도 좌석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마이크에 대고 ‘15번 좌석 손님, 카드 찍으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남한 버스기사 아저씨는 방송도 부나 보다(하나 보다)’는 생각만 했을 뿐 영문 모른 채 앉아 있던 혜영 씨.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 친척집에 가느라 경기도 좌석버스를 탔는데 버스기사 아저씨가 마이크에 대고 ‘15번 좌석 손님, 카드 찍으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남한 버스기사 아저씨는 방송도 부나 보다(하나 보다)’는 생각만 했을 뿐 영문 모른 채 앉아 있던 혜영 씨.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에서는 차장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거든요. 그래서 버스기사님이 방송 불(할) 때도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민망해서 결국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혜영 씨가 또 하나 낯선 게 있었으니 바로 ‘김혜영 님’ ‘김혜영 선생님’ 하는 호칭이다. 북한에서는 학교나 교화소(교도소)에서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님’이라는 존경어(존칭)는 평백성(일반 주민)에게 안 쓴다는 게 혜영 씨의 말이다.
“김혜영 선생님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놀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한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래도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고, ‘님’자를 꼭 붙이더라고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라며 매장 입구에서 인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동안 저도 얼결에 꾸뻑 인사하며 다니기도 했어요.”
 2014년에 남한 사회에 막 나와서 아는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갔던 혜영 씨는 동생이 잠시 나간 사이 간호사가 ‘김혜영 님, 김혜영 님’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니까 이상했지만 주뼛주뼛 접수대 앞으로 다가간 혜영 씨. 간호사가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혜영 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2014년에 남한 사회에 막 나와서 아는 동생과 함께 병원에 갔던 혜영 씨는 동생이 잠시 나간 사이 간호사가 ‘김혜영 님, 김혜영 님’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다. 이름 뒤에 ‘님’자를 붙이니까 이상했지만 주뼛주뼛 접수대 앞으로 다가간 혜영 씨. 간호사가 몇가지 질문을 했는데 혜영 씨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혓바닥에서 ‘오로로 오로로’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예? 예? 반복해서 질문하니까 ‘정신이 나쁘지 않냐(정신질환을 갖고 있지 않냐)’고 생각할까 봐 창피했어요.”
억울한 마음에 속이 상한 혜영 씨는 저 멀리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서 큰소리로 동생을 불렀다. 그랬더니 또다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혜영씨에게 쏠렸다.
“북한에서는 집 앞마당에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렇게 소리쳐 부르거든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소리를 너무 안 지르는 것 같아요.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마수스럽다고(창피하다고) 배 끄러쥐고 웃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오해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혔던 적도 있다. 영화 티켓을 구매한 뒤에 좌석마다 지정된 번호가 있는 줄 모르고 아무 빈자리에나 앉았던 것.
“갑자기 누군가가 자리 주인이라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따졌죠. 우리도 돈 냈는데 왜 일어나라고 하냐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표를 보자고 하시면서 자리를 찾아 데리고 가서 앉혀 주셨어요. 망신스럽기도 했고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가끔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었다. 고깃집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기에 30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고기를 샀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더라는 것.
“할인판매를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기에 완전 싸게 파는가보다 싶었죠. 그런데 고기를 사서 집에 가다 보니 다른 가게에서도 그 가격에 그냥 파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따졌어요. 세일도 안 하면서 거짓말 친다고요.”
가끔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었다. 고깃집에서 세일을 한다고 하기에 30분 동안이나 줄을 서서 고기를 샀는데 오히려 가격이 더 비싸더라는 것.
“할인판매를 한다고 계속 광고를 하기에 완전 싸게 파는가보다 싶었죠. 그런데 고기를 사서 집에 가다 보니 다른 가게에서도 그 가격에 그냥 파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따졌어요. 세일도 안 하면서 거짓말 친다고요.”
오랜 시간 줄을 서는 것도 익숙하진 않다고 했다. “고향에선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니까 줄 잘 서는 사람보다 잘 끼어들어서 사는 게 멋있어 보였는데 남한에서는 매번 줄을 서야 해서 답답했다”는 것. 혜영 씨는 “쌀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내가 당장 먹을 게 충분해야 누굴 도와줄 여유도 있고 줄을 서서 기다릴 여유가 있지, 다 없어져 버릴까 봐 조마조마한데 어떻게 마냥 줄만 서고 있냐”며 겸연쩍어했다. 하지만 혜영 씨는 이제 남한 사회에 왔으니 남한식 공중도덕은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며 활짝 웃었다.
<글. 기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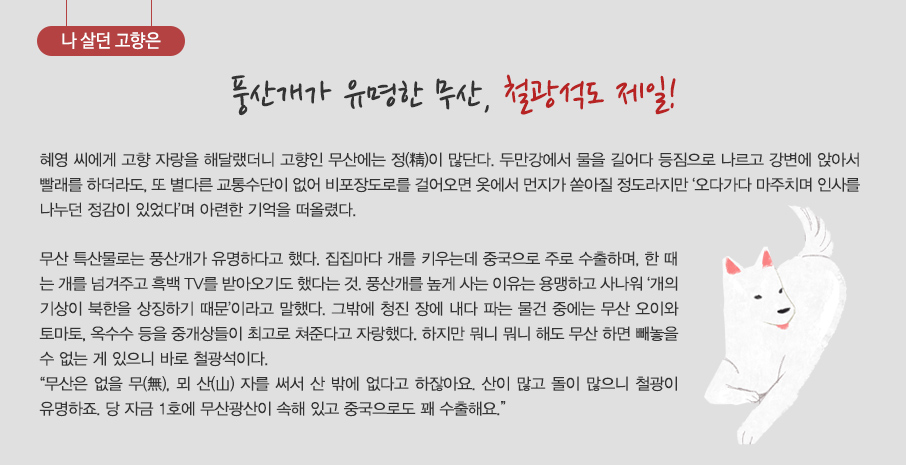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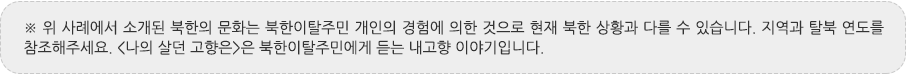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