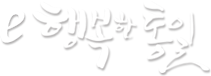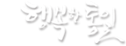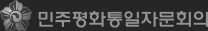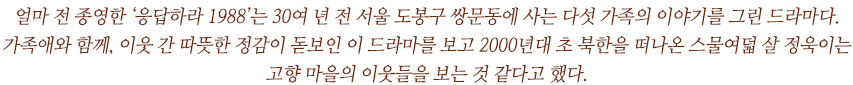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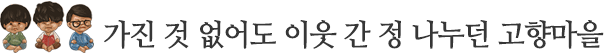
1989년생인 정욱이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어릴 적 북한의 고향마을을 떠올렸다. ‘북한주민 인심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어릴적 엄마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챙겨들고 옆집 앞집 뒷집으로 심부름을 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또한 극중에 진주라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눈사람을 갖고 싶다’고 하자 쌍문동 온 주민이 나선 것처럼, 동네 이웃이 한데 모여 기쁜 일이나, 근심 걱정을 함께 나누던 기억도 난다. 특히 요 무렵엔 설 쇨 떡을 만들기 위해 동네 주민이 다 모여 떡메를 치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
“우리 엄마든 아니면 다른 아줌마든 누군가가 앉아서 떡에 물을 묻히면 아저씨들이 떡메를 쳐요. 근데 떡에 물이 제대로 묻지 않으면 떡메에 붙어서 큰 떡덩어리가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빙 둘러앉은 우린 완전히 신나죠. 운이 좋으면 그 떡을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설 되기 보름 전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정욱이 엄마는 요즘도 음식을 하면 옆집에 갖다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정욱이는 엄마를 극구 말린다고 했다.
“안주느니만 못하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세요.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도 괜히 우리가 준 음식 탓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아무렴 세상이 그렇게까지 각박하겠냐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고 물었더니 정욱이가 들려주는 사연도 만만치 않다. 90년대 말 정욱이 엄마는 중국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사정이 생겨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정욱이는 9살부터 13살까지 혼자 북한을 떠돌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이후 엄마와 연락이 닿았고 엄마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됐지만 ‘엄마가 나를 버렸다’며 한을 품고 살아온 유년기의 상처가 너무 컸다. 그리고 남한에 오기까지 10년간, 중국에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면서 세상의 차가움에 몸서리를 쳤다.
“이젠 엄마와 나, 서로 숨기는 감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된 지 얼마 안됐어요. 엄마와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4년인데, 다시 마음을 열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를 흔히 남한에서는 ‘응팔’이라고 줄여 부른다. 그런데 탈북민들은 줄임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말한다<23호 참조(바로가기)>. 정욱이는 이런 줄임말도 이해 안가는 게 많지만 ‘남한사람들이 쓰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 당황할 때가 있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말할 때 남한 사람들은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들이는 반면 북한 사람들은 진짜 ‘밥 먹자’는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를 흔히 남한에서는 ‘응팔’이라고 줄여 부른다. 그런데 탈북민들은 줄임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말한다<23호 참조(바로가기)>. 정욱이는 이런 줄임말도 이해 안가는 게 많지만 ‘남한사람들이 쓰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 당황할 때가 있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말할 때 남한 사람들은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들이는 반면 북한 사람들은 진짜 ‘밥 먹자’는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뭉개 말하면 포개 듣는다잖아요(남한 속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듣는다’). 근데 잘 모르겠을 땐 차라리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밥 먹자고 하면 언제 먹을 건지 확답을 받아야 혼자 애타는 마음이 덜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으니 바로 ‘고등학생들의 언어’다.
“언젠가 하나센터 누나가 ‘노는 법을 배와준다(가르쳐준다는 뜻의 북한 말)’고 해서 놀이공원에 갔어요. 남한에 온 지 얼마 안됐을 때였는데 고등학생들이 놀러왔길래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여봤죠. 그런데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완전 겁을 먹었죠. 한마디도 못알아듣겠다고 했더니 하나센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나도 못 알아듣겠다. 요즘 애들은 무슨 이상한 줄임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요.(웃음)”
<글. 기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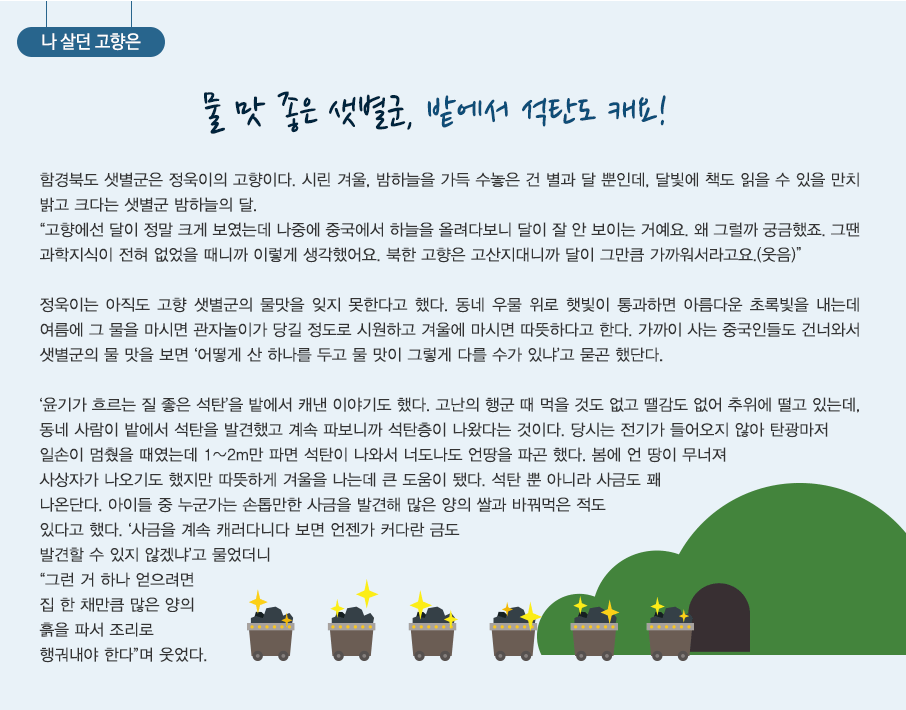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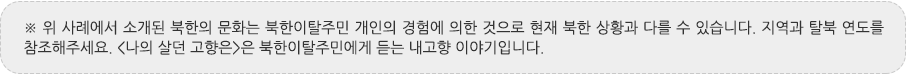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