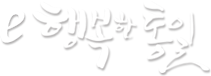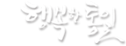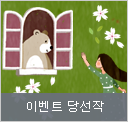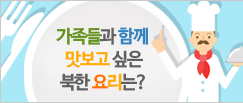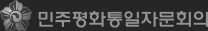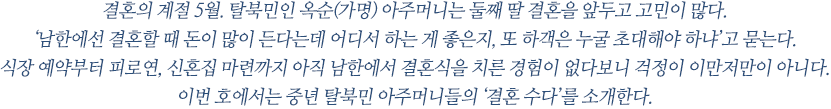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세 명의 중년 여성들이 직장 퇴근 후 옥순 아주머니네 집에 모여 담소를 나눴다. 가장 먼저 화제에 오른 건 딸 결혼식 이야기. 지금은 결혼 풍속도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북한에 있을 때만 해도 누군가 결혼을 하면 온 동네가 들썩이던 기억이 있다. 전통방식으로 개인 집에서 혼례를 치르면 친척들은 쌀을 한 짐씩들 지고 와 창고에 넣어두고 사흘간 잔칫집에 머물며 축하를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이집 저집에서 그릇들을 빌리는 바람에 나중엔 주인 모를 그릇이 남기도 한단다.
“남한에서는 현금봉투 들고 가서, 결혼식 끝나면 점심 먹고 헤어지잖아요. 처음엔 친척끼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집에 가잔 말을 안 할까, 린색(인색)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런 것도 리해(이해)가 가요. 한국은 워낙 바쁘게 사니까요.”
북한에선 축의금으로 왜 쌀을 가져가는지 묻자 옥순 아주머니는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미공급 시기엔 엄마 집에 가더라도 배낭에 식량을 두둑이 넣고 가야 했다”며, 가까운 친척일 경우에는 쌀을 한 말(8kg)씩 지고 가기도 한다고 말해줬다.
 남한에서 결혼식장에 다녀왔던 경험들도 이야기 했다. 양순(가명) 아주머니는 예식장 뷔페에 갔을 때 음식이 많은데도 남이 다 가져갈까 봐 자신도 모르게 접시 가득 담아오곤 했던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이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져오는 습관이 들었지만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후배들이 역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본다고 했다. 반면 승남(가명) 아주머니는 처음 TV에서 남한 상차림을 봤을 때, 접시마다 음식이 한 젓가락씩밖에 담겨있지 않은 게 이상했단다. ‘중국사람들 말로는 남한이 잘산다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초라하고 불쌍할까’ 의문이 들었다고.
남한에서 결혼식장에 다녀왔던 경험들도 이야기 했다. 양순(가명) 아주머니는 예식장 뷔페에 갔을 때 음식이 많은데도 남이 다 가져갈까 봐 자신도 모르게 접시 가득 담아오곤 했던 기억이 난다며 웃었다. 이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가져오는 습관이 들었지만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후배들이 역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는 걸 본다고 했다. 반면 승남(가명) 아주머니는 처음 TV에서 남한 상차림을 봤을 때, 접시마다 음식이 한 젓가락씩밖에 담겨있지 않은 게 이상했단다. ‘중국사람들 말로는 남한이 잘산다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초라하고 불쌍할까’ 의문이 들었다고.
“중국은 밥을 고봉으로 푸는데 남한은 밥을 너무 조금씩 담아요. 막 왔을 땐 두 공기도 성에 차지 않아서 세 공기씩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공기 먹기도 힘들죠. 적게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잖아요.”
좀 ‘웃픈(?)’ 이야기도 있었다. 예식장이 20층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식이 끝나고 나왔을 때 ‘만원’이라는 빨간색 글씨를 보고 그냥 계단으로 걸어 내려왔다는 것. ‘만원’이란 말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가득 찼으니 기다렸다가 타라’는 뜻인 줄 모르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면 돈 만 원을 내시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유료면 유료라고 올라가기 전에 알려줘야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데 무슨 돈을 만 원씩이나 받느냐며 투덜거렸죠. 그날따라 하필 구두를 신고 갔는데... 결국 계단으로 20층을 걸어내려 왔다니까요.”

옥순 아주머니에게 둘째 딸 신혼집은 어디에 마련할 건지 물었더니, 경기도권의 자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봐둔 게 있다고 했다. 지금이야 지방도 괜찮다지만, 처음 남한에 왔을 때만 해도 거주지를 서울로 배정받길 고집했다는 옥순 아주머니. 알고 보니 북한에서 외진 지방은 ‘추방자들이 사는 곳’이란 편견이 있어, 모두 수도권(평양)을 선호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아보니 서울이나 지방도시나 중년 여성들이 소일거리 하면서 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순 아주머니는 ‘말이 이뻐서 서울이 좋다’고도 했다. 북한에서 살 때는 억양이 센 지방사투리보다 평양 말이 좋아서 TV를 보며 따라하곤 했다는 양순 아주머니. 그러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처음 봤는데 말투가 ‘간질간질 애교스럽고 이뻐서’ 인상적이었다고.
그러자 승남 아주머니는 대뜸 “서울말이 아무리 이뻐도 짐승들에게까지 존경어를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묻는다. 명태는 ‘대가리’라고 해야 하는데 ‘명태 머리’라고 존중해 주고, 식당 간판에도 ‘소머리국밥집’라고 써져 있는 게 이상하단다(원래 남한에서도 표준어는 대가리가 맞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양순 아주머니, 얼마 전 겪은 일이라며 식당 관련 이야길 들려줬다.
 “근데 말이지요. 내가 얼마 전에 부대찌개라고 써져있는 식당엘 들어갔거든요. 북한은 군대 공급이 좋아서 군인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군관들이 먹는 덴가 싶어서 툭 들어갔는데 어묵에 소시지에... 받아놓고 보니까 야... 이게 왜 부대찌개라고 하는 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말이지요. 내가 얼마 전에 부대찌개라고 써져있는 식당엘 들어갔거든요. 북한은 군대 공급이 좋아서 군인들이 잘 먹어요. 그래서 군관들이 먹는 덴가 싶어서 툭 들어갔는데 어묵에 소시지에... 받아놓고 보니까 야... 이게 왜 부대찌개라고 하는 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부대찌개라는 음식 이름의 유래에 대해 말해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 어쨌든 부대라는 말이 그 부대인 건 맞구나?”하며 재밌다는 듯 웃는다.
“갈매기살도 그래요. 갈매기살 하니까 아... 바다갈매기를 먹나? 기름도 없는 떼살(살코기)이겠지 싶어서 영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돼지고기를 주더란 말이지요.”
이 말에 승남 아주머니는 “나도 갈매기를 잡은 고긴 줄 알고 아... 갈매기는 이쁜데, 갈매기는 잡지 말지, 불쌍하다 이래 생각했지요”라며 두 아주머니는 한참을 큰소리로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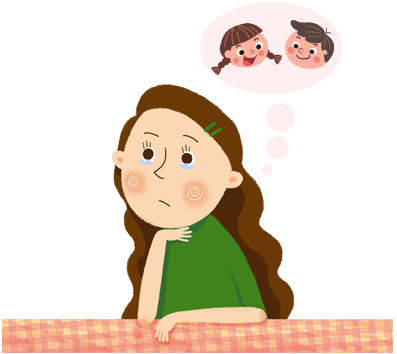 한편 ‘축의금만 8년째’라는 양순 아주머니는 딸 결혼을 앞둔 옥순 아주머니가 마냥 부럽다. 양순 아주머니의 아들은 몇 해 전 북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작년엔 아이도 낳았다고 한다.
한편 ‘축의금만 8년째’라는 양순 아주머니는 딸 결혼을 앞둔 옥순 아주머니가 마냥 부럽다. 양순 아주머니의 아들은 몇 해 전 북한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작년엔 아이도 낳았다고 한다.
“아들이 10살 때 저 혼자 북한을 나왔다가 16살 때 연락해서 남한에 오라고 했더니 안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손주 사진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얼마 전엔 아들이 그러대요. 그때 나올 걸 후회가 된다고요. 북한에 한국드라마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은 거겠죠.”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우울증이 온 적도 있다는 양순 아주머니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렀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울증이 왔을 땐 아일 데리고 밖에 다니는 엄마들이 얼마나 부럽던지, 차가 빵빵거리는 것도 못 듣고 가만히 서서 넋 놓고 봤어요. 신경과에도 두 번이나 갔었고요. 그래도 아들이 장가가서 그런대로 살고 있다고 하니 마음은 편하네요.”
<글. 기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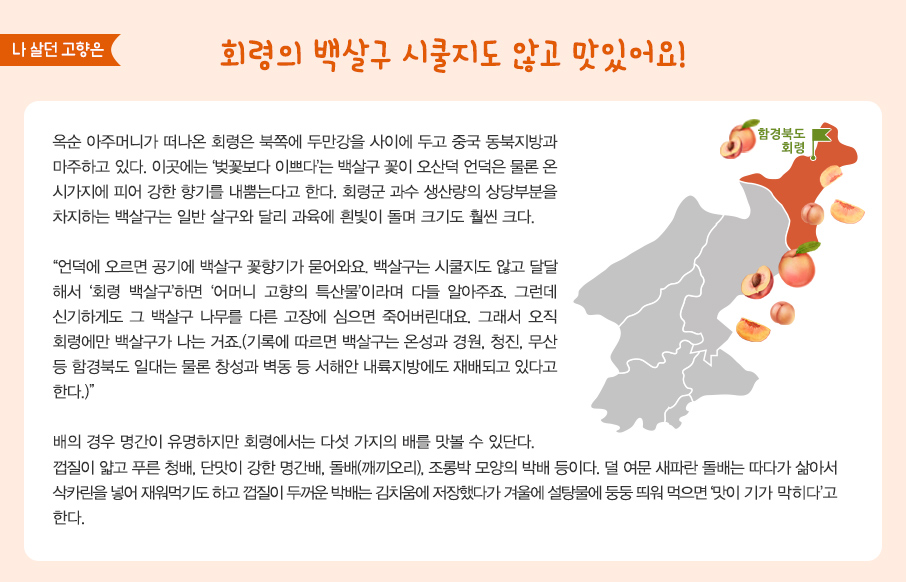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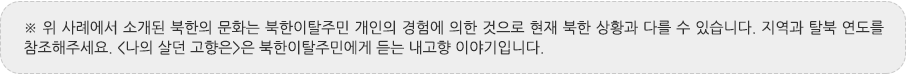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