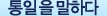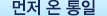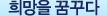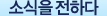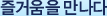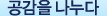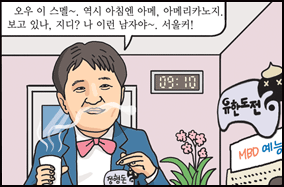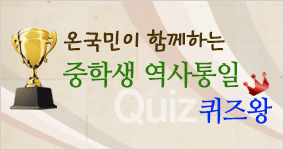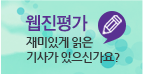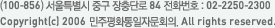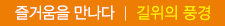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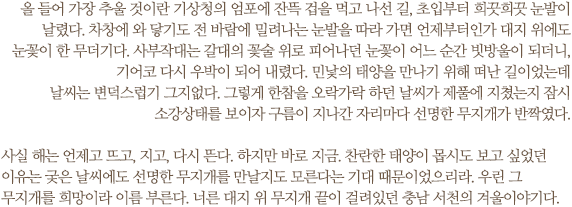

피를 나눈 형제였음에도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당연시 되는 남북의 군사지역. 키를 훌쩍 넘는 갈대들이 우거진 곳에서 남북한의 병사가 만났다. 한쪽은 지뢰를 밟고 있었고, 다른 쪽은 담배를 물고 있었다. 경계와 긴장, 겁에 질린 표정들과 수많은 상념들이 빠르게 지나는 동안에도 갈대들은 묵묵히 주변을 감싸 안고 있었다. 하필 그 장소가 갈대밭이 아니었다면, 생명을 담보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을까.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도입 부분에 등장했던, 신성리 갈대밭은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마주한 금강하구에 펼쳐져 있다. 유명세를 타기 전에는 드라이브 코스나 낚시터로 곧잘 이용됐던 강둑을 따라 걷다 보면 갈대 사이로 이어진 산책로에 도착한다. 질척일까 싶어 몇 번 발을 굴러보자 유순한 흙이 부드럽게 발길을 맞이한다. 보드라운 흙을 밟고 걷다보니 답을 알 수 없어 제자리걸음만 하던 상념들 역시 잦아든다. 마치 옛 동화 속 임금의 귀를 흉보던 어떤 이처럼 이쯤에서 덧없는 상념들을 갈대밭에 묻기로 한다. 갈대의 젖은 소리 사이로 금강의 물소리가 들린다. 눈을 감아도 상상할 수 있는 풍경, 바람과 갈대 그리고 강물이 만들어 내는 평온함 속에 느리게 계절이 흘러간다.


산과 들, 모래사장과 갯벌이 있는 바다까지 두루 품고 있는 서천은 지역적 특색을 갖춘 특산물 역시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세모시다. 역사를 짚어보자면 백제시대부터 무려 1500여 년 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산 모시의 고장이 바로 이곳 서천이기 때문이다. 습기가 많고 해풍이 좋은 곳에서 수확한 모시 줄기를 쪼개고, 잇기를 반복해 만드는 한산 모시는 그 결이 가늘고 고와, 세모시라고 부른다.
 옛날 여염집을 방불케 하는 한산모시관의 문턱을 넘어서면 방 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이 직접 모시를 삼거나 짜는 모습을 유리문 너머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 시린 바람 속 창 밖에서 서성이는 길손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기엔 정이 많은 고장이라 이내 방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이 이어진다.
옛날 여염집을 방불케 하는 한산모시관의 문턱을 넘어서면 방 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인들이 직접 모시를 삼거나 짜는 모습을 유리문 너머 관람할 수 있다. 하지만 겨울 시린 바람 속 창 밖에서 서성이는 길손의 모습을 그냥 지나치기엔 정이 많은 고장이라 이내 방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이 이어진다.
모시 수확은 일 년 중 5월과 8월, 10월에 이루어지지만 머리카락 보다 가는 모시 끝에 침을 묻혀 비벼 잇는, 모시 삼기와 모시 짜기 등은 일 년 내내 쉼 없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모시를 하도 이로 쪼개다 보니 상처와 피가 마를 날이 없고, 급기야 치아에 홈까지 파이는 작업. 그뿐인가 모시를 잇기 위해 비벼대던 무릎과 손끝도 성할 날이 없다. 오죽하면 ‘인이 박힌다’는 말이 생겨났을까. 그렇게 무려 8번의 수작업을 거쳐야 겨우 한산 세모시 한 필이 완성된다. 아득한 수고와 정성이 깃드는 작업, 이 긴 겨울 내도록 장인은 그렇게 모시를 잇고, 짜며 봄을 기다릴 터였다.


 모시와 더불어 한산 지역의 유명인사(?)인 일명 앉은뱅이 술, 한산 소곡주 양조장 역시 모시관에서 멀지 않으니 주향을 따라 가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모시와 더불어 한산 지역의 유명인사(?)인 일명 앉은뱅이 술, 한산 소곡주 양조장 역시 모시관에서 멀지 않으니 주향을 따라 가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 지역을 본관으로 하는, 한산이씨 조상을 모신 문헌서원은 서천 지역의 전통역사마을로 잘 조성되어 있다. 우물터와 연못 정자 특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게 지은 한옥은 한번쯤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기분이 들만큼 정겹고 아늑하다. 사실 볕이 좋은 봄날에 들렸어도 좋았겠다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 이 계절이기에 느끼는 한적함 역시 놓치면 후회할 일이다.


 해지기 전 마량포구에 도착할 요량이라 급해진 마음에 엉덩이도 털지 못하고 또 다시 길을 나선다. 문헌서원에서 마량포구가 위치한 마량리로 향하는 길목 어디쯤 ‘반공 오열사 위령탑’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다섯 학도의 숭고한 호국 혼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매년, 9월이면 이곳에서 추모제도 열린다.
해지기 전 마량포구에 도착할 요량이라 급해진 마음에 엉덩이도 털지 못하고 또 다시 길을 나선다. 문헌서원에서 마량포구가 위치한 마량리로 향하는 길목 어디쯤 ‘반공 오열사 위령탑’이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북한군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다섯 학도의 숭고한 호국 혼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매년, 9월이면 이곳에서 추모제도 열린다.
전쟁터를 누비기엔 아직 어린 나이였을 홍안의 소년들. 그들이 전쟁터로 나선 이유는 남들보다 겁이 없어서도 영웅이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소중한 사람들과 내 고향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싶었으리라. 그리고 그 간절한 열망이 용기가 돼주었을 것이다. 유독 풍요롭다는 말이 어울리는 서천의 자연을 보고 있자면 그토록 간절히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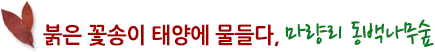
고백컨대, 귓불이 빨갛게 달아오를 만큼 날선 찬바람 속 부러 서천을 찾은 이유는 갈대도 한산의 특산물 때문도 아니었다. 해넘이와 해돋이를 모두 볼 수 있는 서천의 땅 끝 마을, 마량리가 이번 여행의 목적지였다.
마량리는 바다 방향으로 꼬리처럼 길게 튀어나온 독특한 지형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 덕분에 해넘이와 해맞이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바다를 온통 발그레 물들이는 자연경관은 매년 수십 만 명의 인파를 이 소박한 어촌마을로 불러 모을 만큼 빼어나기로 유명하다. 특히 수령 500년 이상의 동백나무가 숲을 이룬, 마량리 동백나무숲은 탁 트인 바다를 앞에 두고 붉은 꽃송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넘이와 해맞이 관람 장소로도 유명하다.

동백나무 숲 사이로 나 있는 돌계단을 차분히 오르다 보면 ‘동백정’이라 이름 붙여진 누각이 보인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혹여나 해넘이를 볼 수 있을까란 기대로 발만 동동 구르기를 수십 분. 끝내 제대로 한번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태양이 원망스럽긴 하지만 그리 밉지 않은 이유는 해넘이 전 인근의 홍원항에서 만난 무지개 덕분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 당연해서 유치하게 느껴지는 말, 하지만 당연하기에 우린 기대한다. 내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때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날들이기를. 그리고 희망한다. 그 기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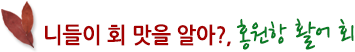
항구가 코앞이니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부질없다. 더욱이 서천은 꽃게와 전어, 주꾸미 등 푸짐한 해산물이 무려 지역 특산품인 곳이다. 마량리에서 일몰을 구경할 계획이라면 홍원항으로 향하는 것을 추천한다. 메인 회 한 접시에, 끝없이 나오는 곁들임 반찬은 밥상 위 주객이 전도 될 만큼 신선한 맛을 보장한다. 특히 양념 없이 담백하게 쪄낸 각종 생선 요리와 꽃게찜은 푸짐한 지방 인심은 물론 싱싱한 해산물에 대한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글. 권혜리 / 사진. 나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