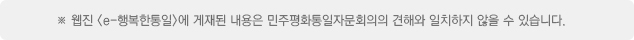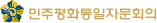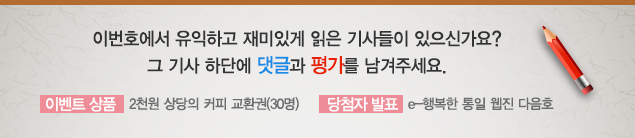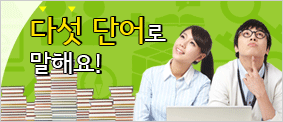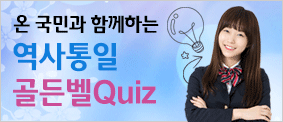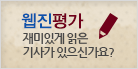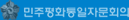스러져가는 봄빛을 쫓아, 떠나간 이의 그림자를 밟으며 충남 서산으로 향한다. 어쩌면 봄은 이별하기에 좋은 계절인지 모른다. 찰나의 아름다움과 소멸의 덧없음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을 온 몸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봄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쪽으로 맨 처음 내려앉은 해미읍성에서 시작되었다.
해미읍성은 조선 태종부터 세종까지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쌓기 시작한 성이지만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이후 천주교의 성지로 더 잘 알려지게 됐다. 100여 년 간 천주교 신도들이 이곳에서 박해를 당했고, 특히 병인박해 때는 무려 1천여 명이 신앙을 버리지 않은 채 죽음을 맞았다. 어깨에 초록색 담쟁이덩굴을 두른채 견고하게 서 있는 해미읍성의 정문, 진남문으로 들어선다.

성 중앙에는 600년을 살았다는 호야나무(회화나무) 고목이 있다. 150년 전 이 고목에는 순교자들의 머리채가 철사줄에 매달려 있었다. ‘자리개질’이나 ‘진둠벙’이라는 말이 피비린내를 품고 있다는 것도 이곳에서 알게 됐다. 신도들을 타작하듯 자리개질로 머리를 메쳐 살해하거나 좀 더 수월하게 죽이기 위해 ‘둠벙’에 생매장을 감행했던 이들이 그처럼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또 죽는 순간까지 신의 이름을 부르다 고통 속에서 산화한 이들은 모두 영생의 길로 안녕히 걸어간 걸까.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 이곳에 오래도록 남아 돌처럼 딱딱해진 가슴을 갖고도 아직 새싹을 틔워내고 있는 호야나무 고목은 알고 있을까.


발길이 처음부터 서산을 향했던 것은 개심사(開心寺) 때문이었다. ‘마음을 여는 절집’이라는 그 이름이 좋았다. 개심사로 가는 아름다운 길이 그 기대감을 더했다. 운산면 신창리 상왕산 깊숙이 자리한 개심사에 닿기 전 만난 건 강원도 대관령목장을 닮은 서산목장이다. 여기저기 풀꽃으로 치장한 봉긋한 언덕 위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 떼가 정겹다. 조금 더 지나 푸른빛의 신창저수지를 끼고 돌면 솔 숲길에 다다르는데, 세심동(洗心洞), 개심사입구(開心寺入口)라는 표석들이 눈에 띈다. ‘마음을 씻는 골짜기’와 ‘마음을 여는 절’. 그 표석들이 시키는 대로 미련 가득한 마음을 맑은 골짜기에서 씻어낸 후, 마음 열 준비를 하고 솔숲을 걷는다. 숲길에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진하게 묻어나오는 솔 향에 어지럽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걸 느낀다.
 작은 연못 ‘경지’를 넘어,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로 괴로움이 없으며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뜻의 안양루를 지나 마침내 해탈문 안쪽, 개심사로 들어간다.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서둘러 꽃잎을 떨구고 있는 겹벚꽃. 개심사의 명물인 청벚꽃은 이미 져버리고 없었다. 꽃심이 연한 녹색을 띠고 있어서 푸르스름해 보이는 청벚꽃은 개심사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석탑, 대웅전, 심검당, 무량수전 등이 모여 있는 ‘지나치게 작은’ 절집 마당 앞에 황량한 심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여느 유명 사찰처럼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다. ‘꽃의 향연’이라는 봄의 절정마저 막 지난 개심사의 첫인상은 그랬다.
작은 연못 ‘경지’를 넘어,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로 괴로움이 없으며 안락하고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뜻의 안양루를 지나 마침내 해탈문 안쪽, 개심사로 들어간다.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서둘러 꽃잎을 떨구고 있는 겹벚꽃. 개심사의 명물인 청벚꽃은 이미 져버리고 없었다. 꽃심이 연한 녹색을 띠고 있어서 푸르스름해 보이는 청벚꽃은 개심사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석탑, 대웅전, 심검당, 무량수전 등이 모여 있는 ‘지나치게 작은’ 절집 마당 앞에 황량한 심정으로 걸음을 멈췄다. 여느 유명 사찰처럼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다. ‘꽃의 향연’이라는 봄의 절정마저 막 지난 개심사의 첫인상은 그랬다.
하지만 오래된 목조불상,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있는 대웅전을 지나 시선은 개심사의 ‘진짜배기’ 심검당(尋劍堂) 기둥에 가서 머무른다. 심검당은 스님들의 요사채로, 그 지붕을 단청도 없이 제멋대로 휜 나무들이 떠받치고 있었다. 둘러보니 심검당 뿐 아니라 무량수각, 범종각, 명부전 등 개심사의 다른 전각들도 모두 자연이 주는 재료 그대로의 휘어지고 구부러진 목재를 사용해 지어졌다. 획일화되지 않고 모두 제각각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고 서 있는 기둥이 오히려 더 멋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맞다, 나무가 곧게 자란다는 건 편견일 뿐이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물과 바람과 공기와 햇볕에 따라 제 모양을 바꾼다. ‘올곧게, 바르게’라는 단어 안에 길들여진 마음 한켠이 느슨하게 이완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았다. 마음을 연다는 것,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 아직 남은 미련쯤 일부러 내다 버리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떠나가는 것들에 굳이 마음을 여밀 필요가 있을까.

 가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다. 머리를 토닥이며 말없이 웃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 발길을 옮긴 곳은 서산 마애여래삼존불이 있는 운산면 가야산이다. 마애불은 자연암벽에 선을 새겨 넣거나 도톰하게 솟아오르도록 다듬어 만든 불상을 말하는데, 가야산 기슭 층암절벽에선 3개의 거대한 마애불을 만날 수 있다.
가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다. 머리를 토닥이며 말없이 웃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 발길을 옮긴 곳은 서산 마애여래삼존불이 있는 운산면 가야산이다. 마애불은 자연암벽에 선을 새겨 넣거나 도톰하게 솟아오르도록 다듬어 만든 불상을 말하는데, 가야산 기슭 층암절벽에선 3개의 거대한 마애불을 만날 수 있다.
본존인 석가여래상이 가운데 서 있고 좌측에 보살입상, 우측에 반가사유상이 조각돼 있는데 마치 누군가가 꺼낸 재미있는 이야기에 한바탕 크게 웃은 뒤, 아직 여운을 즐기는 것처럼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다. ‘백제의 미소’라 이름 붙은 이 표정은 계절에 따라, 해의 고도에 따라, 그리고 보는 이의 심경에 따라 각각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혼자 고독한 명상에 잠겨 있거나 위에서 근엄하게 내려다보는 불상이 아니다. 석가여래입상도, 양 옆의 협시불들도 모두 맘 좋은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다정다감하고 유쾌하다. 그래서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그 미소를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미소를 짓게된다. 마음에 남은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듯 했다.

 해가 뉘엿해질 때 쯤 서산의 북쪽 바닷가로 차를 몰아 들른 곳은 ‘서산의 미항’ 삼길포항이다. 북쪽에 점점이 흩어져 있던 대난지도, 소난지도, 비경도 등의 섬과 이름 없는 무인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둠 속에 제 모습을 감출 것이다. 가까이 항구 주변에, 그리고 멀리 대산공단에도 불이 켜지면 바다 위에 비친 불빛들이 저녁나절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화려한 야경의 군무를 시작할 것이다. 우럭이나 놀래미의 입질을 기다리느라 항구 주변에 늘어선 낚시꾼들은 번번이 망둥이만 건져올리는데도 아직 돌아갈 생각을 않는다. 삼길포항 선착장 아래, 좌우로 죽 늘어선 선상횟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린다. 막 썰어낸 싱싱한 회에 소주 한 잔 나누며 조용히 그 소란에 묻히고 싶은 항구의 풍경.
해가 뉘엿해질 때 쯤 서산의 북쪽 바닷가로 차를 몰아 들른 곳은 ‘서산의 미항’ 삼길포항이다. 북쪽에 점점이 흩어져 있던 대난지도, 소난지도, 비경도 등의 섬과 이름 없는 무인도들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둠 속에 제 모습을 감출 것이다. 가까이 항구 주변에, 그리고 멀리 대산공단에도 불이 켜지면 바다 위에 비친 불빛들이 저녁나절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화려한 야경의 군무를 시작할 것이다. 우럭이나 놀래미의 입질을 기다리느라 항구 주변에 늘어선 낚시꾼들은 번번이 망둥이만 건져올리는데도 아직 돌아갈 생각을 않는다. 삼길포항 선착장 아래, 좌우로 죽 늘어선 선상횟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린다. 막 썰어낸 싱싱한 회에 소주 한 잔 나누며 조용히 그 소란에 묻히고 싶은 항구의 풍경.
 5월 초 아직 바닷바람이 차다. 바다 색깔이 점점 짙은 빛으로 변한다. 마음을 씻고 열어도 미련은 가시지 않는다. 잊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닌 것도 잘 안다. 애인에게 날마다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쓰는 시(詩), 이성복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잘 있지 말아요 그리운...’ 마음이 놓아주지 않는 한 사랑은 진행형이다. 봄이 가고, 꽃이 져도 계속된다. 주변에 있는 자갈 하나를 집어들어 가만히 있는 애먼 바다에 힘껏 던져본다.
5월 초 아직 바닷바람이 차다. 바다 색깔이 점점 짙은 빛으로 변한다. 마음을 씻고 열어도 미련은 가시지 않는다. 잊는다고 잊혀지는 게 아닌 것도 잘 안다. 애인에게 날마다 부치지 못하는 편지를 쓰는 시(詩), 이성복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잘 있지 말아요 그리운...’ 마음이 놓아주지 않는 한 사랑은 진행형이다. 봄이 가고, 꽃이 져도 계속된다. 주변에 있는 자갈 하나를 집어들어 가만히 있는 애먼 바다에 힘껏 던져본다.
<글. 기자희 / 사진. 나병필>